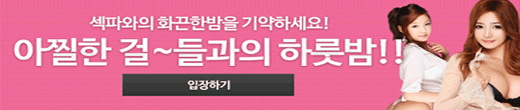휘 이~이잉!
음사하고 습한 습기를 몰고 바람이 분다. 지척을 분간 할 수 없는 암동의 어둠 속을 걷는 묵의의 청년이 있다. 이곳이 지옥인지, 생시인지도 모른다. 업보를 갖고 태어난 인간이기에 격어야 할 삶인지도 모른다.
찌지직! 츠츠!
바닥을 바글바글하게 메우고 기어오르는 독혈의(毒血蟻).
습지 바닥을 걸을 때마다 살아있는 생물체라면 무엇이던 들러붙어 피를 빨아대는 독개미가 빠드득! 빠드득! 하고 몸서리치는 소리를 내며 무더기로 밟혀 죽어도 악착같이 무릎위로 기어오른다. 청년의 피부를 물어뜯고 피부 속으로 파고들었다.
청년은 부르르 몸을 떨며 걸음을 내디딘다. 습지 바닥에 흐르는 물은 물이라기보다는 독충들이 죽어서 썩은 시액(屍液)으로 걸을 때마다 타액(唾液)처럼 발에 찐득거리고 붙어 떨어지지 않으려 한다. 오장육부(五臟六腑)가 뒤집어질 듯 역겨운 독기마저 스멀스멀 올라왔다.
우…욱!
청년은 역한 냄새에 왈칵! 먹었던 음식들뿐만 아니라 내장까지 토해낼 듯 토악질을 했다.
츠 츠측 츠츠~!
기괴한 소리를 내며 독을 뿜어대는 거미 독지주(毒蜘蛛)가 어깨위에 떨어지고, 독 가루를 뿜어대는 나비 때 독인시(毒鱗翅)때가 날아들어 청년의 몸을 향하여 달려들었다. 청년의 얼굴과 손은 온통 붓고 상처가 나고 썩기 시작했다. 모공에서는 누런 농액(濃液)과 농즙(濃汁)이 흘러 내리고 있다. 독인시
일그러진 청년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보기가 힘든 지경이다. 청년은 쌍장을 내둘러 독충들을 떨어트리건만, 부지기수(不知其數)로 달려든다. 오히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새로운 독충들이 굶주린 아귀처럼 먹이를 찾아 달려든다.
위 이이잉. 스~으으!
파리 중에도 흡혈을 하는 독쌍시(毒雙翅)와 보통 모기보다도 큰 독문(毒蚊)이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암동을 가득 메우고 달려들었다.
"으…음!"
청년은 신체와 얼굴이 독충으로 뒤덮이자 신음을 내지른다.
화~라락!
청년은 삼매진화(三昧眞火)를 일으켜 독충들을 태워 버린다. 불길에 청년의 용모가 들어났다. 설 무영이었다. 그는 유끼꼬를 위하여 야래향(夜來香)의 수석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동영의 고도(孤島) 헤비시마(蛇島)에 와서 세 개의 난관을 치루는 중이다.
"보이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이고,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다."
설 무영은 어금니를 깨물고 발을 내딛는다. 생즉사(生卽死) 사즉생(死卽生), 불도의 진리는 생(生)의 진리이다. 생은 곧 죽음이고, 죽음은 곧 생이다. 생을 두려워하는 자(者), 죽음이 두렵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생이 두렵다.
그는 정신일도(精神一到)하여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아갔다. 몸에 다닥다닥 붙은 독충들이 기고만장(氣高萬丈), 피부를 헤치고 살을 갉고 흡혈을 하였다. 암동에는 더욱 짙은 독무가 흘러 나왔다.
하 윽~!
설 무영이 울컥! 한모금의 선혈을 뱉어냈다. 독무가 흐르는 암동에는 독 기운을 내뿜는 버섯 마발(馬勃)과 희령( 岺), 독적전(毒赤箭)등 독초(毒草)들과. 사람을 통째로 녹여 삼키는 흡인초(吸引草)의 잎이 너울거렸다. 진액(津液)이 질질 흐르는 흡인초의 잎이 설 무영의 허리를 감았다. 그가 우수를 신검(身劍)으로 하여 베어내도 꿈틀거리며 기어든다.
스르르 스륵! 츠~츳!
독초 사이에서 눈에서 시퍼런 빛을 뿜는 독사(毒蛇)때와 지네 중에서도 맹독을 갖은 독오공(毒蜈蚣)들이 기어 나왔다. 독사 때와 독오공이 설 무영의 몸에 휘감고 달라붙어 악귀같이 혀를 날름거렸다.
"으~으…윽!"
설 무영의 살점을 물어 뜯어내어 뼈가 허옇게 들어나자 뼈를 갉기 시작했다. 그 밑을 헤아릴 수 없는 어둠의 지하 계곡을 앞에 두고 그는 후르르! 몸서리치며 독충들을 떨어뜨리며 휘젓는다.
스 슥! 후~르륵!
설 무영의 몸이 계곡을 넘어 날아갔다. 두 번째 난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음…!"
두 번째의 난관인 동굴을 들어서자마자 뜨거운 열기가 몸을 휘감았다. 그러나 연화동(蓮花洞)의 용암(鎔巖)이 들끓는 용하수(鎔河水)와 북해의 극빙한담(極氷寒潭)을 견뎌내고 극양과 극음의 양극기도(兩極氣道)를 갖춘 설 무영이었다. 그러나 그의 전신에는 비 오듯 땀이 솟았다.
까악 깍!
문득 거대한 까마귀가 그를 덮쳤다. 저승에 산다는 불새, 화번아(火蒜鴉)가 불을 내뿜으며 불에 달아올라 철침 같은 발톱으로 그를 낚아채려했다.
"뇌(雷)!"
그는 일갈과 함께 우수로 그어갔다. 화번아가 날카로운 예음을 터트리며 화염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그의 몸에 흐르던 땀마저도 메말라 피부가 쩌 억 쩍! 갈라졌다. 하지만 그는 눈에 시퍼런 빙기(氷氣)의 안광을 일으키며 나아갔다. 그는 은연중에 익힌 태허법천빙공(太虛法天氷功)을 일으켰던 것이다.
크~르륵! 크으!
온통 시뻘겋고 거대한 두꺼비가 두 개의 혀를 날름거리며 그에게 다가왔다. 달을 먹어 월식을 일으킨다는 화하마(火蝦 )였다. 설 무영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다. 화하마가 화염을 토해내며 두 개의 흉측한 혀를 길게 빼내며 달려들었다. 화하마가 집채 같은 발을 옮길 때마다 지축이 흔들리며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다.
설 무영은 태허법천빙수장(太虛法天氷手掌)으로 쌍장을 휘둘렀다.
콰~르르릉!
쌍장에서 일어나는 빙강(氷剛)과 화기가 부딪쳐 온통 동굴은 증기(蒸氣)로 가득 찼다. 화하마의 두 갈래 혀가 얼음조각으로 부서져 내렸다. 그의 앞에 빙하가 흐르고 있었다.
철 썩!
지체치 않고 뛰어든 설 무영의 몸이 빙하 속으로 뛰어들어 잠겼다. 빙하의 물결이 그의 몸에 부딪쳐 둔탁한 소리를 내고, 빙하의 빙기에 쩌 억 쩍! 피부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건만, 그는 유유히 빙어(氷魚)처럼 앞으로 빙하를 헤엄쳐 나아갔다.
쩌~정쩡 쿵!
빙석들이 투명하게 부서져 나가고 거대한 구렁이가 은하수를 뿌리듯 용솟음치며 나타났다. 빙천에서만 산다는 하늘을 가릴 듯 큰 대한망(大寒蟒)이었다. 대한망이 입을 벌렸다. 입을 다물 때마다 엄청난 빙하의 물결이 파도를 이루며 설 무영의 몸을 내동댕이쳤다.
크~왜액! 퍼억!
수많은 돌기와 같은 비늘로 뒤덮인 대한망의 꼬리가 그의 몸을 내리 덮쳤다.
"헉~!"
그는 고공(高空)으로 몸을 솟구치며 건곤천무장(乾坤天武掌)으로 쏟아낸 부공삼매의 불꽃이 대한망의 몸통을 태워갔다.
크~억!
허지만, 대한망은 꿈적도 하지 않고 몸을 갈지자로 흔들며 설 무영에게 다가왔다. 오히려 성난 대한망이 혀를 날름거리며 달려들었다. 순간, 대한망의 턱밑에 하얀 피부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휘 릭!
설 무영의 몸이 다시 한 번 솟구치며 그의 우수가 대한망의 턱 밑을 뚫고 들어갔다. 그는 대한망에 깊이 박힌 우수를 쑤우욱! 잡아 뺐다. 온몸을 흔들며 요동치는 대한망의 두 개골에서 녹색 피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대한망의 허연 골수를 움켜쥐고 있었다. 대한망의 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빙하에 쏟아져 내렸다.
타~앗!
설 무영은 몸을 높이 솟구쳐 빙산을 넘어 날았다.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나는 또 다른 관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설 무영은 뚜벅뚜벅 석실을 걸어 들어갔다.
석실에는 오색의 운무가 피어나고 사방에는 투명한 유리벽과 엷은 비단으로 된 벽사(碧紗)들이 오색찬연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퍼 엉!
석실 가운데 하얀 안개가 터져 오르고 인영(人影)이 나타났다. 사십대의 여인이 자애로운 미소와 자태로 그에게 다가왔다.
"어…! 어머니!"
설 무영의 어머니 궁단향(弓端香)이었다. 그때 괴인이 나타나 그녀의 옷을 잡아 찢었다. 입에서 피를 왈칵 쏟아내는 그녀의 나신이 적나라하게 들어났다.
"크 으흐흑! 어머니.........!"
괴인의 한 손이 그녀의 풍요한 젖가슴을 움켜쥐고 짓누르고 다른 손은 방초 사이를 헤집어 갔다. 여인의 몸이 퍼덕이며 비명을 질렀다. 설 무영의 가슴에는 애절한 분노가 뒤끓었다.
"안 돼! 으흐흑!"
설 무영은 온 힘을 다하여 어머니에게 달려가지만 전혀 움직여지지 않고 제자리에 있을 뿐이다.
푸 스스!
인영들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또 다른 인영이 나타났다.
"아버지…!?"
설 무영의 부친 설 진탁(渫進卓)이었다. 흑포를 두른 괴인이 설진탁의 목을 비틀어 쥐고 있었다. 설 진탁은 피를 토하며 아들을 부른다.
"무영아!"
"아…아버지! 크 으흐흑!"
설 진탁에게 다가가려고 기어가고 있는 설 무영은 제자리에 있을 뿐이다. 바닥을 긁는 그의 손톱에는 선혈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괴인이 설 진탁을 내동댕이치고 혈무를 일으킨 장력을 휘둘렀다. 설 진탁은 한줌의 핏덩어리로 변해 뒹굴었다.
"크 흐흑! 아버지, 아버지.......!"
설 무영이 끓는 피를 한 움큼 뱉어내는 사이에 인영은 사라지고 혈객이 나타났다. 너덜너덜 찢긴 옷과 전신이 피로 뒤덮인 혈객은 피가 뚝! 뚝! 떨어지는 혈검을 쥐고 설 무영을 바라보았다. 마치 붉은 피를 뒤집어 슨 저승 야차 같았다.
"원수를… 원수를 값… 값아 다오!"
혈객은 마지막 힘을 다하여 말을 내뱉고는 힘없이 쓸어져갔다.
"크~ 으흐흐흑! 선조 어르신!"
설 무영의 가슴은 통한과 슬픔으로 뒤범벅이 되었다. 눈에는 분노와 증오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크…억!
그는 또 다시 짙은 선혈을 뱉어냈다. 심화가 뒤끓으면 심맥이 상처를 입어 주화입마에 드는 법이다. 그는 분연히 일어나 앉았다.
"분노와 증오, 욕망과 환희, 모든 것이 허상이다."
그는 정좌를 하고 단전에 기를 모아 호흡정화(呼吸精和)를 하였다.
"호 호호…! 호호.......!"
요기(妖氣)로 가득한 한 무리의 여인들이 나타나 그의 주변을 맴돌았다. 여인들은 완연히 속이 비쳐지는 각각 적, 황, 백, 녹, 홍 빛의 능라의(綾羅衣)를 걸치고 있었다. 여인들이 무늬가 하려한 비취금침(翡翠衾枕)을 설 무영의 옆에 깔았다.
여인들은 음탕한 눈빛으로 설 무영을 바라보며 황홀한 춤을 추기 사작하였다. 능라의를 나풀거릴 때마다 여인들의 선연한 굴곡이 들어나는 나신이 완연히 나타났다. 고혹적인 자태와 뇌살적인 나신은 설 무영의 온 신경을 전율시키고도 남았다.
한 여인이 금침 위에 엎드려 희귀한 자세를 취했다. 농익은 둔부와 허리를 비틀릴 때마다 검은 숲에 가려진 홍색의 비소(秘所)가 설 무영의 혼을 뒤흔들어 놓았다. 여인들이 설 무영의 어깨를 부여잡고 돌아갔다. 한 여인이 뽀얀 허벅지를 그의 어깨에 올리고 선정적으로 몸을 흔들었다.
벌린 허벅지 사이로 불룩한 둔덕 아래에는 은밀한 샘이 흘러 첨습(沾濕)된 방초가 바람에 흔들리듯 살랑거렸다.
"주군! 나는 당신의 여인......!"
설 무영을 바라보는 여인은 뇌쇄적인 미소를 담은 유끼꼬의 매혹적인 잔상(殘像)이었다. 설 무영은 욕화로 인하여 신경세포가 폭발할 듯 팽팽히 일어서는 것을 누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백팔번뇌(百八煩惱)와 함께, 희로애락(喜怒哀樂), 오욕칠정(五慾七情)의 인간군상(人間群像)들이 소용돌이 쳤다.
"가 랏!"
그는 여인들을 향하여 가슴에 모은 두 손을 내 저었다.
"호 호홋......!"
그러나 여인들은 지칠 줄 모르고 거머리처럼 그에게 다가섰다.
"오라버니…! 나야!"
"영랑! 소녀 외로워요......!"
"가군(家君)! 건우가 기다려요!"
그의 뇌리에 하루미, 전도련, 소류진의 암영이 손짓을 하였다. 그러나 천정무심(天井無心)의 기도(氣道)로 운공을 시작한 설 무영의 정수리에는 정화된 오색 서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안휘(安徽) 황산(黃山)에서 북쪽에 우뚝솟은 두 개의 기봉(奇峰)이 있다.
그 봉우리가 하늘에 닿도록 높아 운해일출(雲海日出)을 볼 수 있는 사자봉(獅子峰)과 단설봉(丹雪峰)이다. 그 중에도 단설봉은 이름 그대로 단풍과 백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절경의 기봉이다. 백설로 뒤덮인 단설봉으로 이르는 중턱에는 칼로 자른 듯 평면을 이룬 단애는 그 모양이 흡사 벌집과 같다.
풀 한포기 나지 않는 시커먼 흑암으로 이뤄진데다 여기저기 동굴이 숭숭 뚫려있어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면 동굴을 스치는 바람소리가 마치 귀신의 호곡성처럼 들려온다. 절경은 아름다우나 산세가 높고 험하여 약초군도 발을 돌린다는 황산허리에 돌연 하나의 인영이 솟구쳐 나왔다.
화~라락!
"헉…! 헉~!"
인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북쪽을 향해 질주하는 한명의 여인이었다. 나이는 사십 전후로 보이는 그녀는 한눈에 보아도 우아한 기품이 엿보이는 미모의 귀부인이었다. 하지만 중년 미부인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다.
몸에 걸친 의복은 온통 피로 물들여져 있으며 그마마 여기저기 찢겨나가 성한 곳이 없었다.
아마도 누군가와 처절한 악전고투를 벌인 듯하였다.
"허 으......."
온몸이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중년부인은 연신 초조하게 뒤를 돌아보며 험지를 가로 질렀다. 중년부인의 오른손에는 한 자루의 보검이 움켜져 있었다. 그리고 중년부인의 품에는 한 명의 유아(幼兒)가 안겨 있었다.
천진난만한 동안(童顔)의 유아.
칠 팔세 가량의 궁포(宮袍)차림 유아는 용포(龍袍)에 쌓여 있었다. 유아는 해맑은 표정으로 천진난만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유아는 어딘가 파리한 안색을 지녀 일견하기에도 병약한 인상을 풍겼다.
".......!"
유아의 입술은 어미의 품을 찾는 듯 입술을 오물거리며 이따금 중년 부인의 가슴을 더듬고 있었다. 유아를 안은 중년 미부인은 초조한 표정으로 무슨 연고로 질풍처럼 내 달리는 것인가?
"살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놈들의 마수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년부인은 필사적인 심정으로 이를 악물었다.
"내가 죽더라도…, 왕자만은 꼭 살려야 한다. 기필코 황산을 넘어 남경에 들어가야 한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헌데 왕자라니? 그렇다면 유아가 왕자란 말인가?
그렇다. 유아는 당금 후주(後周) 황제의 어린왕자였다.
용운왕자(龍雲王子) 주태무(周泰茂).
황제의 두 왕자 중 혜련황후(惠蓮王后)가 낳은 왕자로서 세종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황실의 보배다. 중년부인은 공주를 은밀히 호위하는 호검시위(護劍侍衛), 은금자련(隱琴紫蓮) 월미선(月媚善)이다. 이 이름은 황실을 수호하는 자밀위(刺密委)에 속한 여자밀위(女刺密委)의 위사(委使) 이름이기도 하다.
그런데 누가 있어 감히 황제를 이을 만상보옥(萬上寶玉)인 용운왕자를 노린단 말인가?
휘~ 리릭!
은금자련(隱琴紫蓮)은 사력을 다해 질주하며 간절히 바랬다.
"하늘이여, 굽어 살피소서. 왕자께서 무사히 황산을 넘어 남경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늘은 은금자련의 바램을 무참히 깨 버리려는가?
"우~.우… 우........!"
은금자련의 뒤쪽으로부터 한 가닥의 사나운 장소성들이 들려왔다.
"놈들이다!"
무서운 살기가 내재되어 있는 장소성은 듣는 순간 은금자련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바르르 떨었다. 방금 들려온 장소성은 어젯밤부터 끈질기게 뒤쫓아 오는 흉적(凶賊)들이 내지르는 것이다. 흉적들은 사악한 마기를 뿜는 고수들이었다.
용운왕자를 호위하던 자밀위(刺密衛)들을 일장에 추풍낙엽처럼 날려 버리는 가공할 장공의 소유자가 있는가 하면, 바람조차 가른다는 경공의 소유자인 은금자련의 경공술이 무색하게 하는 쾌검의 검수도 있다.
녹포(綠袍)의 괴한들.
아니 나타난 흉적들은 여럿이지만 그들을 제외한 녹색복면인이 있었다. 녹색복면인은 싸움을 관망하였고, 녹포괴인들은 이백 여명의 자밀위 여 고수들이 유린하고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갔다.
은금자련은 자신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용운왕자를 구할 수 없다는 절망에 사로잡혀야만 했었다. 자밀위의 여 고수들이 죽음으로 그들을 방어하는 동안에 그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향하여 사력을 다해 경공술을 펼쳤다.
하지만 녹색괴인들은 실로 가공하였다. 살아 남아있는 자위밀의 항거를 뚫고 끈질기게 은금자련을 추격해 온 것이다. 사인의 녹색괴인! 지금 은금자련을 쫓는 자는 바로 그자들이다. 하나 더 무서운 것은 그런 고수들을 수하로 부리고 있는 녹색 복면인이었다. 만약 그가 직접 나섰다면 은금자련은 용운왕자를 데리고 이곳까지 도망치지도 못했을 것이다.
"우~ 우~!"
다시 장소성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조금 전보다도 더 명확하게 들렸다.
"버…! 벌써.......!"
은금자련은 절망으로 눈앞이 아득해졌다. 한데 문득 그녀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녀는 막 하나의 구릉을 넘고 있었다. 구릉 너머에는 높은 절벽이 우측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길 좌측으로는 자갈밭이 깔려 있었다. 은금자련의 시선은 동굴이 여기저기 뚫린 단애에 머물러 있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늘로 뻗쳐 올라간 단설봉의 한쪽 면을 무 자르듯 자른 단애(斷厓) 밑둥치와 암석이 잇닿아 교묘히 얽힌 모서리! 무성하게 덩굴이 엉켜 있는 그 곳이었다.
휘~이 이잉......!
단애 및 골짜기로 부는 바람에 덩굴이 가볍게 일렁이자 그 사이로 은밀한 암동의 검은 입구가 입을 벌리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동굴.......!?"
동굴은 실로 은밀하였다. 만약 바람이 불어 덩굴을 흔들어 놓지 않는다면 발견할 수 없었을 정도이다. 은금자련의 두 눈에 순간적으로 희색이 스쳤다. 그녀는 망설일 것도 없이 동굴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후 르르륵~!
은금자련은 궁신탄영(弓身彈影) 경신술을 발휘하여 암석을 밟는 탄력으로 몸을 뒤집어 동굴로 들어갔다. 동굴의 크기는 그리 넓지는 않았지만, 바닥이 고른 흑석위에도 넝쿨이 엉켜 있었다. 습한 바람이 안쪽으로 부터 불어왔다.
은금자련은 용운왕자를 안고 동굴 안쪽 모서리를 돌아섰다. 동굴 안에는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밑에 작은 물웅덩이 소담(小潭)이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안심이 된다는 듯 긴 숨을 내쉬고는 용운왕자를 품에서 내려놓았다. 그러나 멀어졌던 장소성 소리가 다시 작게 들려왔다.
"제발 하늘이시여! 그들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그녀는 두 손을 모으며 간절히 빌었다. 이곳마저 그들에게 들킨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다. 은금자련은 그들의 잔악한 무공으로 사라져간 여자 밀위들을 생각하며 몸서리쳤다. 그들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장소성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폈다. 입술을 잘근 씹고는 용운왕자를 다시 품안에 안았다. 소담을 지나 더 안쪽 동굴로 들어갔다. 그녀는 암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곳에 이르러 암석사이의 공간에 용운왕자를 내려놓았다.----------------------------------------------
음사하고 습한 습기를 몰고 바람이 분다. 지척을 분간 할 수 없는 암동의 어둠 속을 걷는 묵의의 청년이 있다. 이곳이 지옥인지, 생시인지도 모른다. 업보를 갖고 태어난 인간이기에 격어야 할 삶인지도 모른다.
찌지직! 츠츠!
바닥을 바글바글하게 메우고 기어오르는 독혈의(毒血蟻).
습지 바닥을 걸을 때마다 살아있는 생물체라면 무엇이던 들러붙어 피를 빨아대는 독개미가 빠드득! 빠드득! 하고 몸서리치는 소리를 내며 무더기로 밟혀 죽어도 악착같이 무릎위로 기어오른다. 청년의 피부를 물어뜯고 피부 속으로 파고들었다.
청년은 부르르 몸을 떨며 걸음을 내디딘다. 습지 바닥에 흐르는 물은 물이라기보다는 독충들이 죽어서 썩은 시액(屍液)으로 걸을 때마다 타액(唾液)처럼 발에 찐득거리고 붙어 떨어지지 않으려 한다. 오장육부(五臟六腑)가 뒤집어질 듯 역겨운 독기마저 스멀스멀 올라왔다.
우…욱!
청년은 역한 냄새에 왈칵! 먹었던 음식들뿐만 아니라 내장까지 토해낼 듯 토악질을 했다.
츠 츠측 츠츠~!
기괴한 소리를 내며 독을 뿜어대는 거미 독지주(毒蜘蛛)가 어깨위에 떨어지고, 독 가루를 뿜어대는 나비 때 독인시(毒鱗翅)때가 날아들어 청년의 몸을 향하여 달려들었다. 청년의 얼굴과 손은 온통 붓고 상처가 나고 썩기 시작했다. 모공에서는 누런 농액(濃液)과 농즙(濃汁)이 흘러 내리고 있다. 독인시
일그러진 청년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보기가 힘든 지경이다. 청년은 쌍장을 내둘러 독충들을 떨어트리건만, 부지기수(不知其數)로 달려든다. 오히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새로운 독충들이 굶주린 아귀처럼 먹이를 찾아 달려든다.
위 이이잉. 스~으으!
파리 중에도 흡혈을 하는 독쌍시(毒雙翅)와 보통 모기보다도 큰 독문(毒蚊)이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암동을 가득 메우고 달려들었다.
"으…음!"
청년은 신체와 얼굴이 독충으로 뒤덮이자 신음을 내지른다.
화~라락!
청년은 삼매진화(三昧眞火)를 일으켜 독충들을 태워 버린다. 불길에 청년의 용모가 들어났다. 설 무영이었다. 그는 유끼꼬를 위하여 야래향(夜來香)의 수석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동영의 고도(孤島) 헤비시마(蛇島)에 와서 세 개의 난관을 치루는 중이다.
"보이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이고,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다."
설 무영은 어금니를 깨물고 발을 내딛는다. 생즉사(生卽死) 사즉생(死卽生), 불도의 진리는 생(生)의 진리이다. 생은 곧 죽음이고, 죽음은 곧 생이다. 생을 두려워하는 자(者), 죽음이 두렵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생이 두렵다.
그는 정신일도(精神一到)하여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아갔다. 몸에 다닥다닥 붙은 독충들이 기고만장(氣高萬丈), 피부를 헤치고 살을 갉고 흡혈을 하였다. 암동에는 더욱 짙은 독무가 흘러 나왔다.
하 윽~!
설 무영이 울컥! 한모금의 선혈을 뱉어냈다. 독무가 흐르는 암동에는 독 기운을 내뿜는 버섯 마발(馬勃)과 희령( 岺), 독적전(毒赤箭)등 독초(毒草)들과. 사람을 통째로 녹여 삼키는 흡인초(吸引草)의 잎이 너울거렸다. 진액(津液)이 질질 흐르는 흡인초의 잎이 설 무영의 허리를 감았다. 그가 우수를 신검(身劍)으로 하여 베어내도 꿈틀거리며 기어든다.
스르르 스륵! 츠~츳!
독초 사이에서 눈에서 시퍼런 빛을 뿜는 독사(毒蛇)때와 지네 중에서도 맹독을 갖은 독오공(毒蜈蚣)들이 기어 나왔다. 독사 때와 독오공이 설 무영의 몸에 휘감고 달라붙어 악귀같이 혀를 날름거렸다.
"으~으…윽!"
설 무영의 살점을 물어 뜯어내어 뼈가 허옇게 들어나자 뼈를 갉기 시작했다. 그 밑을 헤아릴 수 없는 어둠의 지하 계곡을 앞에 두고 그는 후르르! 몸서리치며 독충들을 떨어뜨리며 휘젓는다.
스 슥! 후~르륵!
설 무영의 몸이 계곡을 넘어 날아갔다. 두 번째 난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음…!"
두 번째의 난관인 동굴을 들어서자마자 뜨거운 열기가 몸을 휘감았다. 그러나 연화동(蓮花洞)의 용암(鎔巖)이 들끓는 용하수(鎔河水)와 북해의 극빙한담(極氷寒潭)을 견뎌내고 극양과 극음의 양극기도(兩極氣道)를 갖춘 설 무영이었다. 그러나 그의 전신에는 비 오듯 땀이 솟았다.
까악 깍!
문득 거대한 까마귀가 그를 덮쳤다. 저승에 산다는 불새, 화번아(火蒜鴉)가 불을 내뿜으며 불에 달아올라 철침 같은 발톱으로 그를 낚아채려했다.
"뇌(雷)!"
그는 일갈과 함께 우수로 그어갔다. 화번아가 날카로운 예음을 터트리며 화염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그의 몸에 흐르던 땀마저도 메말라 피부가 쩌 억 쩍! 갈라졌다. 하지만 그는 눈에 시퍼런 빙기(氷氣)의 안광을 일으키며 나아갔다. 그는 은연중에 익힌 태허법천빙공(太虛法天氷功)을 일으켰던 것이다.
크~르륵! 크으!
온통 시뻘겋고 거대한 두꺼비가 두 개의 혀를 날름거리며 그에게 다가왔다. 달을 먹어 월식을 일으킨다는 화하마(火蝦 )였다. 설 무영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다. 화하마가 화염을 토해내며 두 개의 흉측한 혀를 길게 빼내며 달려들었다. 화하마가 집채 같은 발을 옮길 때마다 지축이 흔들리며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다.
설 무영은 태허법천빙수장(太虛法天氷手掌)으로 쌍장을 휘둘렀다.
콰~르르릉!
쌍장에서 일어나는 빙강(氷剛)과 화기가 부딪쳐 온통 동굴은 증기(蒸氣)로 가득 찼다. 화하마의 두 갈래 혀가 얼음조각으로 부서져 내렸다. 그의 앞에 빙하가 흐르고 있었다.
철 썩!
지체치 않고 뛰어든 설 무영의 몸이 빙하 속으로 뛰어들어 잠겼다. 빙하의 물결이 그의 몸에 부딪쳐 둔탁한 소리를 내고, 빙하의 빙기에 쩌 억 쩍! 피부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건만, 그는 유유히 빙어(氷魚)처럼 앞으로 빙하를 헤엄쳐 나아갔다.
쩌~정쩡 쿵!
빙석들이 투명하게 부서져 나가고 거대한 구렁이가 은하수를 뿌리듯 용솟음치며 나타났다. 빙천에서만 산다는 하늘을 가릴 듯 큰 대한망(大寒蟒)이었다. 대한망이 입을 벌렸다. 입을 다물 때마다 엄청난 빙하의 물결이 파도를 이루며 설 무영의 몸을 내동댕이쳤다.
크~왜액! 퍼억!
수많은 돌기와 같은 비늘로 뒤덮인 대한망의 꼬리가 그의 몸을 내리 덮쳤다.
"헉~!"
그는 고공(高空)으로 몸을 솟구치며 건곤천무장(乾坤天武掌)으로 쏟아낸 부공삼매의 불꽃이 대한망의 몸통을 태워갔다.
크~억!
허지만, 대한망은 꿈적도 하지 않고 몸을 갈지자로 흔들며 설 무영에게 다가왔다. 오히려 성난 대한망이 혀를 날름거리며 달려들었다. 순간, 대한망의 턱밑에 하얀 피부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휘 릭!
설 무영의 몸이 다시 한 번 솟구치며 그의 우수가 대한망의 턱 밑을 뚫고 들어갔다. 그는 대한망에 깊이 박힌 우수를 쑤우욱! 잡아 뺐다. 온몸을 흔들며 요동치는 대한망의 두 개골에서 녹색 피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대한망의 허연 골수를 움켜쥐고 있었다. 대한망의 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빙하에 쏟아져 내렸다.
타~앗!
설 무영은 몸을 높이 솟구쳐 빙산을 넘어 날았다.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나는 또 다른 관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설 무영은 뚜벅뚜벅 석실을 걸어 들어갔다.
석실에는 오색의 운무가 피어나고 사방에는 투명한 유리벽과 엷은 비단으로 된 벽사(碧紗)들이 오색찬연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퍼 엉!
석실 가운데 하얀 안개가 터져 오르고 인영(人影)이 나타났다. 사십대의 여인이 자애로운 미소와 자태로 그에게 다가왔다.
"어…! 어머니!"
설 무영의 어머니 궁단향(弓端香)이었다. 그때 괴인이 나타나 그녀의 옷을 잡아 찢었다. 입에서 피를 왈칵 쏟아내는 그녀의 나신이 적나라하게 들어났다.
"크 으흐흑! 어머니.........!"
괴인의 한 손이 그녀의 풍요한 젖가슴을 움켜쥐고 짓누르고 다른 손은 방초 사이를 헤집어 갔다. 여인의 몸이 퍼덕이며 비명을 질렀다. 설 무영의 가슴에는 애절한 분노가 뒤끓었다.
"안 돼! 으흐흑!"
설 무영은 온 힘을 다하여 어머니에게 달려가지만 전혀 움직여지지 않고 제자리에 있을 뿐이다.
푸 스스!
인영들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또 다른 인영이 나타났다.
"아버지…!?"
설 무영의 부친 설 진탁(渫進卓)이었다. 흑포를 두른 괴인이 설진탁의 목을 비틀어 쥐고 있었다. 설 진탁은 피를 토하며 아들을 부른다.
"무영아!"
"아…아버지! 크 으흐흑!"
설 진탁에게 다가가려고 기어가고 있는 설 무영은 제자리에 있을 뿐이다. 바닥을 긁는 그의 손톱에는 선혈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괴인이 설 진탁을 내동댕이치고 혈무를 일으킨 장력을 휘둘렀다. 설 진탁은 한줌의 핏덩어리로 변해 뒹굴었다.
"크 흐흑! 아버지, 아버지.......!"
설 무영이 끓는 피를 한 움큼 뱉어내는 사이에 인영은 사라지고 혈객이 나타났다. 너덜너덜 찢긴 옷과 전신이 피로 뒤덮인 혈객은 피가 뚝! 뚝! 떨어지는 혈검을 쥐고 설 무영을 바라보았다. 마치 붉은 피를 뒤집어 슨 저승 야차 같았다.
"원수를… 원수를 값… 값아 다오!"
혈객은 마지막 힘을 다하여 말을 내뱉고는 힘없이 쓸어져갔다.
"크~ 으흐흐흑! 선조 어르신!"
설 무영의 가슴은 통한과 슬픔으로 뒤범벅이 되었다. 눈에는 분노와 증오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크…억!
그는 또 다시 짙은 선혈을 뱉어냈다. 심화가 뒤끓으면 심맥이 상처를 입어 주화입마에 드는 법이다. 그는 분연히 일어나 앉았다.
"분노와 증오, 욕망과 환희, 모든 것이 허상이다."
그는 정좌를 하고 단전에 기를 모아 호흡정화(呼吸精和)를 하였다.
"호 호호…! 호호.......!"
요기(妖氣)로 가득한 한 무리의 여인들이 나타나 그의 주변을 맴돌았다. 여인들은 완연히 속이 비쳐지는 각각 적, 황, 백, 녹, 홍 빛의 능라의(綾羅衣)를 걸치고 있었다. 여인들이 무늬가 하려한 비취금침(翡翠衾枕)을 설 무영의 옆에 깔았다.
여인들은 음탕한 눈빛으로 설 무영을 바라보며 황홀한 춤을 추기 사작하였다. 능라의를 나풀거릴 때마다 여인들의 선연한 굴곡이 들어나는 나신이 완연히 나타났다. 고혹적인 자태와 뇌살적인 나신은 설 무영의 온 신경을 전율시키고도 남았다.
한 여인이 금침 위에 엎드려 희귀한 자세를 취했다. 농익은 둔부와 허리를 비틀릴 때마다 검은 숲에 가려진 홍색의 비소(秘所)가 설 무영의 혼을 뒤흔들어 놓았다. 여인들이 설 무영의 어깨를 부여잡고 돌아갔다. 한 여인이 뽀얀 허벅지를 그의 어깨에 올리고 선정적으로 몸을 흔들었다.
벌린 허벅지 사이로 불룩한 둔덕 아래에는 은밀한 샘이 흘러 첨습(沾濕)된 방초가 바람에 흔들리듯 살랑거렸다.
"주군! 나는 당신의 여인......!"
설 무영을 바라보는 여인은 뇌쇄적인 미소를 담은 유끼꼬의 매혹적인 잔상(殘像)이었다. 설 무영은 욕화로 인하여 신경세포가 폭발할 듯 팽팽히 일어서는 것을 누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백팔번뇌(百八煩惱)와 함께, 희로애락(喜怒哀樂), 오욕칠정(五慾七情)의 인간군상(人間群像)들이 소용돌이 쳤다.
"가 랏!"
그는 여인들을 향하여 가슴에 모은 두 손을 내 저었다.
"호 호홋......!"
그러나 여인들은 지칠 줄 모르고 거머리처럼 그에게 다가섰다.
"오라버니…! 나야!"
"영랑! 소녀 외로워요......!"
"가군(家君)! 건우가 기다려요!"
그의 뇌리에 하루미, 전도련, 소류진의 암영이 손짓을 하였다. 그러나 천정무심(天井無心)의 기도(氣道)로 운공을 시작한 설 무영의 정수리에는 정화된 오색 서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안휘(安徽) 황산(黃山)에서 북쪽에 우뚝솟은 두 개의 기봉(奇峰)이 있다.
그 봉우리가 하늘에 닿도록 높아 운해일출(雲海日出)을 볼 수 있는 사자봉(獅子峰)과 단설봉(丹雪峰)이다. 그 중에도 단설봉은 이름 그대로 단풍과 백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절경의 기봉이다. 백설로 뒤덮인 단설봉으로 이르는 중턱에는 칼로 자른 듯 평면을 이룬 단애는 그 모양이 흡사 벌집과 같다.
풀 한포기 나지 않는 시커먼 흑암으로 이뤄진데다 여기저기 동굴이 숭숭 뚫려있어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면 동굴을 스치는 바람소리가 마치 귀신의 호곡성처럼 들려온다. 절경은 아름다우나 산세가 높고 험하여 약초군도 발을 돌린다는 황산허리에 돌연 하나의 인영이 솟구쳐 나왔다.
화~라락!
"헉…! 헉~!"
인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북쪽을 향해 질주하는 한명의 여인이었다. 나이는 사십 전후로 보이는 그녀는 한눈에 보아도 우아한 기품이 엿보이는 미모의 귀부인이었다. 하지만 중년 미부인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다.
몸에 걸친 의복은 온통 피로 물들여져 있으며 그마마 여기저기 찢겨나가 성한 곳이 없었다.
아마도 누군가와 처절한 악전고투를 벌인 듯하였다.
"허 으......."
온몸이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중년부인은 연신 초조하게 뒤를 돌아보며 험지를 가로 질렀다. 중년부인의 오른손에는 한 자루의 보검이 움켜져 있었다. 그리고 중년부인의 품에는 한 명의 유아(幼兒)가 안겨 있었다.
천진난만한 동안(童顔)의 유아.
칠 팔세 가량의 궁포(宮袍)차림 유아는 용포(龍袍)에 쌓여 있었다. 유아는 해맑은 표정으로 천진난만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유아는 어딘가 파리한 안색을 지녀 일견하기에도 병약한 인상을 풍겼다.
".......!"
유아의 입술은 어미의 품을 찾는 듯 입술을 오물거리며 이따금 중년 부인의 가슴을 더듬고 있었다. 유아를 안은 중년 미부인은 초조한 표정으로 무슨 연고로 질풍처럼 내 달리는 것인가?
"살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놈들의 마수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년부인은 필사적인 심정으로 이를 악물었다.
"내가 죽더라도…, 왕자만은 꼭 살려야 한다. 기필코 황산을 넘어 남경에 들어가야 한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헌데 왕자라니? 그렇다면 유아가 왕자란 말인가?
그렇다. 유아는 당금 후주(後周) 황제의 어린왕자였다.
용운왕자(龍雲王子) 주태무(周泰茂).
황제의 두 왕자 중 혜련황후(惠蓮王后)가 낳은 왕자로서 세종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황실의 보배다. 중년부인은 공주를 은밀히 호위하는 호검시위(護劍侍衛), 은금자련(隱琴紫蓮) 월미선(月媚善)이다. 이 이름은 황실을 수호하는 자밀위(刺密委)에 속한 여자밀위(女刺密委)의 위사(委使) 이름이기도 하다.
그런데 누가 있어 감히 황제를 이을 만상보옥(萬上寶玉)인 용운왕자를 노린단 말인가?
휘~ 리릭!
은금자련(隱琴紫蓮)은 사력을 다해 질주하며 간절히 바랬다.
"하늘이여, 굽어 살피소서. 왕자께서 무사히 황산을 넘어 남경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늘은 은금자련의 바램을 무참히 깨 버리려는가?
"우~.우… 우........!"
은금자련의 뒤쪽으로부터 한 가닥의 사나운 장소성들이 들려왔다.
"놈들이다!"
무서운 살기가 내재되어 있는 장소성은 듣는 순간 은금자련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바르르 떨었다. 방금 들려온 장소성은 어젯밤부터 끈질기게 뒤쫓아 오는 흉적(凶賊)들이 내지르는 것이다. 흉적들은 사악한 마기를 뿜는 고수들이었다.
용운왕자를 호위하던 자밀위(刺密衛)들을 일장에 추풍낙엽처럼 날려 버리는 가공할 장공의 소유자가 있는가 하면, 바람조차 가른다는 경공의 소유자인 은금자련의 경공술이 무색하게 하는 쾌검의 검수도 있다.
녹포(綠袍)의 괴한들.
아니 나타난 흉적들은 여럿이지만 그들을 제외한 녹색복면인이 있었다. 녹색복면인은 싸움을 관망하였고, 녹포괴인들은 이백 여명의 자밀위 여 고수들이 유린하고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갔다.
은금자련은 자신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용운왕자를 구할 수 없다는 절망에 사로잡혀야만 했었다. 자밀위의 여 고수들이 죽음으로 그들을 방어하는 동안에 그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향하여 사력을 다해 경공술을 펼쳤다.
하지만 녹색괴인들은 실로 가공하였다. 살아 남아있는 자위밀의 항거를 뚫고 끈질기게 은금자련을 추격해 온 것이다. 사인의 녹색괴인! 지금 은금자련을 쫓는 자는 바로 그자들이다. 하나 더 무서운 것은 그런 고수들을 수하로 부리고 있는 녹색 복면인이었다. 만약 그가 직접 나섰다면 은금자련은 용운왕자를 데리고 이곳까지 도망치지도 못했을 것이다.
"우~ 우~!"
다시 장소성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조금 전보다도 더 명확하게 들렸다.
"버…! 벌써.......!"
은금자련은 절망으로 눈앞이 아득해졌다. 한데 문득 그녀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녀는 막 하나의 구릉을 넘고 있었다. 구릉 너머에는 높은 절벽이 우측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길 좌측으로는 자갈밭이 깔려 있었다. 은금자련의 시선은 동굴이 여기저기 뚫린 단애에 머물러 있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늘로 뻗쳐 올라간 단설봉의 한쪽 면을 무 자르듯 자른 단애(斷厓) 밑둥치와 암석이 잇닿아 교묘히 얽힌 모서리! 무성하게 덩굴이 엉켜 있는 그 곳이었다.
휘~이 이잉......!
단애 및 골짜기로 부는 바람에 덩굴이 가볍게 일렁이자 그 사이로 은밀한 암동의 검은 입구가 입을 벌리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동굴.......!?"
동굴은 실로 은밀하였다. 만약 바람이 불어 덩굴을 흔들어 놓지 않는다면 발견할 수 없었을 정도이다. 은금자련의 두 눈에 순간적으로 희색이 스쳤다. 그녀는 망설일 것도 없이 동굴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후 르르륵~!
은금자련은 궁신탄영(弓身彈影) 경신술을 발휘하여 암석을 밟는 탄력으로 몸을 뒤집어 동굴로 들어갔다. 동굴의 크기는 그리 넓지는 않았지만, 바닥이 고른 흑석위에도 넝쿨이 엉켜 있었다. 습한 바람이 안쪽으로 부터 불어왔다.
은금자련은 용운왕자를 안고 동굴 안쪽 모서리를 돌아섰다. 동굴 안에는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밑에 작은 물웅덩이 소담(小潭)이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안심이 된다는 듯 긴 숨을 내쉬고는 용운왕자를 품에서 내려놓았다. 그러나 멀어졌던 장소성 소리가 다시 작게 들려왔다.
"제발 하늘이시여! 그들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그녀는 두 손을 모으며 간절히 빌었다. 이곳마저 그들에게 들킨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다. 은금자련은 그들의 잔악한 무공으로 사라져간 여자 밀위들을 생각하며 몸서리쳤다. 그들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장소성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폈다. 입술을 잘근 씹고는 용운왕자를 다시 품안에 안았다. 소담을 지나 더 안쪽 동굴로 들어갔다. 그녀는 암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곳에 이르러 암석사이의 공간에 용운왕자를 내려놓았다.----------------------------------------------

최고관리자
| 가입일 | 2016-08-11 | 접속일 | 2024-12-28 |
|---|---|---|---|
| 가입일 | 2016-08-11 | ||
| 접속일 | 2024-12-28 | ||
| 서명 | 황진이-19금 성인놀이터 | ||
| 태그 | |||
| 황진이-무료한국야동,일본야동,중국야동,성인야설,토렌트,성인야사,애니야동
야동토렌트, 국산야동토렌트, 성인토렌트, 한국야동, 중국야동토렌트, 19금토렌트 |
|||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