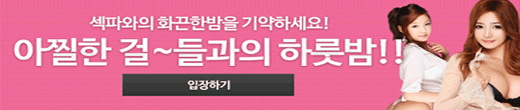설 무영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투혼사의 당황하는 눈빛! 설 무영에게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무상기도(無上氣道)가 흐르는 것이었다. 잠시 설 무영을 주시하던 투혼사가 무엇인가 알아냈다는 듯 희소를 터트렸다.
"하하하…! 그러고 보니 네놈은 강호무림의 표적 흑설매였구나!"
".........!"
투혼사의 말을 듣고 모두들 놀라며 설 무영을 주시하였다. 철륜광마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폭갈을 하였다.
"그…! 그렇다면 본문의 소문주 신투귀면(神偸鬼面)을 주살한 자란 말이냐?"
설 무영은 절혼괴도(切魂傀盜)의 독수에 당하고 그에게 황금선녀상을 건네준 후 목숨을 다한 신투귀면 허수(許手)를 말함을 알았다. 설 무영은 냉담하게 내 뱉었다.
"난 신투귀면을 죽이지 않았소."
"네놈이 한 짓인 줄 뻔히 알고 있는데, 변명이냐?"
투혼사가 게거품을 입에 물 듯 내뱉었다. 설 무영이 빠르게 답변하였다.
"신투귀면은 절혼괴도(切魂傀盜) 마석주(麻夕舟)에게 당했소. 절혼괴도는 내손에 사라지고, 그들의 시신은 소출이 거두어 옥문현 송림 야산에 안장하였소."
"이놈아! 너의 살수는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발뺌을 할 것이냐?"
"헛! 참........"
"노부들이 너희들을 경시한 것이 잘못이다. 굳이 무력에 의해서만이 물러간다면 어쩔 수 없구나."
시혼채의 말을 신호로 그들은 설 무영과 유끼꼬를 빙 둘러싸고 협공자세를 취하였다. 설 무영은 막무가내로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그들을 더 마주할 의기를 잃었다. 불쑥 일갈과 함께 철륜광마가 설 무영을 향해 도(刀)를 휘저었다.
"놈! 너의 목으로 소문주의 원혼을 달래마!"
스스슥 휭!
도광이 번뜩이며 맹렬한 도강이 설 무영의 목을 자를 위세로 그어왔다. 그때 검은 그림자가 설 무영의 앞을 막아섰다. 강렬한 은빛 강막이 형성되고 도강(刀剛)을 가르며 비늘 조각 같은 장력이 철류광마의 전신을 주살해 갔다.
"헛! 어린살음장(御麟殺陰掌)…!?"
한마디 외마디를 지른 철륜광마가 다섯 걸음을 뒤로 물러섰다. 어린살음장을 반출한 것은 유끼꼬였다. 의복이 갈기갈기 찢긴 철륜광마의 가슴은 장흔과 피멍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봉황쌍후(鳳凰雙女) 흑봉황(黑鳳凰)의 절전된 절기를 보게 되다니.......?)
시혼채가 중얼거리며 유끼꼬를 향하여 협공을 하였다. 시혼채의 몸이 반원을 그리며 유끼꼬의 옆구리를 주살해 갔다. 또한 황포의 보두괴도 유끼꼬를 협살하러 몸을 날렸다.
"어딜........!"
유끼꼬는 좌수의 어린살비조(御麟殺飛爪)로 다섯줄기의 강기를 일으켜 보두괴의 가슴을 가르고, 동시에 우수로 철륜광마를 주살하면서 좌수로 장막을 일으켜 시혼채와 맞서갔다.
"노부들이 계집 하나에 쩔쩔매다니.......!"
철륜광마는 분통을 터트리며 유끼꼬의 어린살음장을 장막으로 맞서며 흑도(黑刀)를 빼어들었다.
스 르르릉!
그때 유끼꼬의 어린살비조의 예기에 어깻죽지가 잘린 보두괴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으…악!"
보두괴는 선혈이 흐르는 어깻죽지를 붙잡고 쓸어졌다. 유끼꼬는 그들을 맞이하여 그렇게 이십여 차례의 초식을 주고받았다. 복면 속의 유끼꼬 표정은 읽을 수 없었고, 다만 그녀의 무공에 그들은 점차 깊은 상처를 당하고 있었다.
"그만~!"
묵묵히 바라보고 있던 설 무영의 입에서 일갈이 터졌다. 검은 무복의 유끼꼬는 설 무영 앞에 좌 무릎을 꿇어 좌궤(左跪)하였고, 그들은 충혈 된 눈으로 설 무영을 직시하였다. 설 무영은 품안에서 공령하영환을 꺼내 시혼채 앞에 내던지고 말했다.
"함부로 살생을 원하지 않소. 다만, 이것을 전달하고 자초지종을 알려주려 했을 뿐인데, 이렇도록 거부한다면 그냥 물건만 주고 가겠소."
"아니, 이…! 이것은 공령하영환.......!"
두 호법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그들의 전대 문주 환영제(幻影帝) 야명(冶鳴)과 함께 사라진 공령하문 문주의 신표였다. 뱉어 내듯이 말을 마친 설 무영과 유끼꼬는 되돌아서 가고 있었다.
"자, 잠간만 대협께서는 걸음을 멈추어 주시오!"
철륜광마가 황급히 설 무영을 불러 세웠다.
"아직도 내게 볼일이 있소?"
뒤돌아선 설 무영이 물었다. 철륜광마가 급히 설 무영 앞을 막아서서 포권을 하였다.
"노부들이 결례를 하였습니다. 노부가 문주께 모시겠으니 안으로 드시지요."
".......?"
설 무영은 그들의 태도가 갑자기 변하는 것에 어리둥절하였다. 설 무영은 그들을 따라 그들의 의사당(議事堂)인 자공각(紫空閣)으로 향했다. 자공각 안에는 태사위에 사십 전후의 중년인과 좌우로 두 명의 나이 지긋한 무인이 양립하고 있었다.
그들은 문주인 야투일왕(夜偸一王) 저명손(楮冥飡)과 법계당주(法戒堂主)인 등천일노(騰天一
老), 군무당주(軍武堂主)인 승무호군(昇鶩虎君)이었다. 철륜광마가 야투일왕에게 다가가 자초지종을 말하고 공비하령환을 건네주었다.
공령하영환을 받아든 야투일왕은 기겁을 하여 황급히 태사위에서 내려와 설 무영 앞에 부복하는 것이었다.
"후배들의 과오에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야투일왕에 이어 당주와 호법이 그 앞에 부복을 하였다. 설 무영은 졸지에 일어난 상황에 당황하여 그들을 만류하였다.
"후배라니 웬 말씀입니까? 단지 소부는 신표를 전하고, 한 가지 청이 있어 들린 것뿐인데........"
"아닙니다. 전대 문주님의 신표를 갖고 있다면, 그 분의 독문절학을 전수 받았을 테이니 저희들에게는 사형(師兄)이십니다."
설 무영이 야투일왕의 말을 들으니 이치에 어긋나는 말이 아니었다.
"그건 사실이오. 소부는 사조(師祖)이신 환영일신공(幻影一神公)의 환영비혼신공(幻影秘魂神功)의 모든 비급무공도 연마하였소!"
"헉! 절전된 사조의 무공을....... 그렇다면 사, 사숙(師숙) 원로이십니다. 불초 후배들이 모르고 저지른 과오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만 저희들은 전대 문주와 함께 신표도 사라지고 소문주의 행방이 묘연하기에 봉문을 하고 있던 지경으로 저지른 우매한 행동이었습니다. 전대 문주께서는 어찌 되셨는지 후배들은 귀담아 듣겠습니다."
"환영제(幻影帝) 야명(冶鳴)께서는........"
설 무영은 공령하영환을 취하게 된 경과와 환영제와 환영일신공과의 기연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들은 그때서야 사조들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풀고 처연한 표정을 지었다. 야투일왕이 두 손으로 공령하영환을 다시 설 무영에게 건네며 말했다.
"한 가지 청이라고 하였는데 청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는 문주의 명령입니다."
"문주의 명령이라니…?"
또 다시 의구심에 든 설 무영에게 야투일왕이 설명을 하였다.
"공령하문의 오래된 묵계가 있습니다. 사조의 무공비급을 전수 받고 문주의 신표를 소유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바로 공령하문의 문주가 되어 공령하문을 강호에 절대문파로 만든다는 것이지요. 또한 소문주가 없는 상황에서 후배 저명손은 임시 문주를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로 사숙께서는 문주로서 말씀하여 주시면 혼신을 다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야투일왕은 진중하고 침중한 표정으로 변하여 말하였다. 설 무영은 창졸지간에 중원에서 개방 다음가는 연락망과 소식통을 갖고 있는 공령하문의 문주가 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야투일왕께서는 아수천에 대해서 알고 있소?"
"허 헛......!"
야투일왕이 내쉬던 숨을 들이키며 놀랬다. 그는 설 무영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아직은 젊은 청년이건만 완벽한 균형의 골격, 한없는 지혜와 현기의 눈빛, 초 절정고수에서만 흐르는 무형기도는 가히 종사의 기품이 넘치고 있었다. 그런 설 무영에게서 암흑 속에 감추어진 절대 사마의 제왕인 아수라에 관한 이야기가 서슴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었다.
"속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문주에 관한 건으로 봉문하고 있는 야투일왕도 아수천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는 바였다. 허지만 그는 알고 있는 사안만 더듬더듬 털어놓았다.
이미 아수라에 관해 알고 있는 설 무영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는 것은 없었다. 굳게 입을 닫은 채 듣고 있던 설 무영이 태산같이 결연한 눈빛으로 말하였다.
"지금부터 아수라의 지부천의 위치와 행동, 아수천에 관한 무림의 동태, 등 아수천에 관한 모든 것을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하시오!"
지엄한 문주의 한마디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설 무영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아수천에 관해 식견을 낱낱이 알려주었다.
천황혼마전의 고인(古人) 파슬은 말했었다. 마신환경재림(魔신還鏡再臨)이지만, 천룡탄파마경(天龍誕破魔鏡), 악마의 신이 거울을 통해 환생하지만, 천룡이 태어나 악마의 신과 거울을 부순다고 하였다.
개봉(開封).
당금 후주(後周) 황실의 도읍지.
남하문(南夏門) 근처에는 상점들과 노상이 즐비하고 오가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노후한 상점에서 고루거각을 연상케 하는 상점과 기루, 객루들이 뒤섞여 있는 거리에는 떠돌이 장사꾼에 행상까지 목청을 돋우는 상가는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이다.
거리를 오가는 세인들은 농, 공, 행상을 비롯하여 한족, 몽골족, 남만족, 고려인, 색목인을 비롯하여 동영인의 모습까지 천태만별의 모습이 보인다. 복잡한 거리가 한눈에 보이는 성벽 가까운 곳에는 장정 여럿이 안아도 모자랄 몇 백 년을 버티어온 도화목이 한그루 보인다.
얼마 지나면 춘풍이 다가옴을 느끼는 도화목의 가지에 꽃망울이 기지개를 펴는 준비가 한창이다. 헌데 도화목 아래는 각양각색의 복장을 한 세인들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들 중에는 검과 도를 찬 낭인이 있는가 하면 추와 창, 편 등을 장한과 체구가 작은 여인들도 눈에 뜨였다.
이곳은 다름 아닌 인간시장이었다. 당금 시대는 흉년과 기근이 연속되고, 혈난의 전국시대에 각국의 병군에서 낙오한 군사들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무림 군소종파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갈 곳을 잃은 무인들마저 가세하여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인간시장을 찾아 목숨을 팔고 있었다.
그들이 팔려고 하는 것은 노예, 하인, 처첩을 비롯하여 무인도 있다. 대체로 중개인들이나, 노예상인들이지만, 스스로 자신을 팔고 있는 자들도 있다.
"월하(月河)의 전추라(塞秋羅), 벽안금발(壁眼金髮)의 색목여인, 흑안다즙(黑眼多汁)의 몽골녀에서 청순가련(淸純佳緣)한 고려여인까지 모두 있습니다! 자! 흥정을 하세요......."
형형색색의 복장을 한 여인들을 세워놓고 목청을 돋우는 노예상인 옆에서는 또 다른 흥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피혁으로 외눈을 가린 장한이 외치고 있었다.
"몽골과의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도백철(刀魄喆)입니다. 백 오십 량으로 목숨을 지키실 분, 없어요? 없으면 백사십 량을 부른 이분에게 갑니다. 자! 자! 흥정들 하세요. 늦기 전에....... 이 인후상(印吼商)은 틀림없는 거래만 합니다."
황금으로 무인과 자객의 목숨을 사고파는 시장이었다.
"여봐요!"
사십 전후의 중년여인이 외눈의 사나이 뒤에 서있는 도를 든 오십대의 무인 도백철을 바라보며 꽥! 소리를 질렀다. 외눈의 인후상이란 사나이가 굽실거렸다.
"네! 네. 부인......."
"나이가 많아 힘이나 쓰겠어요?"
인후상이 두툼한 입가에 비소를 지으며 되물었다.
"밤에만 쓰시려고……?"
"와하하하.........!"
인후상의 비아냥거림에 구경하고 있던 세인들의 폭소가 터져 나왔다.
"빌어먹을 인간~!"
중년여인은 냉갈을 터트리며 디룩디룩 살찐 몸을 이끌고 사라졌다. 중년여인이 사라지자, 인후상이 흑립을 쓰고 바라보고 있는 묵객에게 간사한 미소를 흘리며 말했다.
"대협께서는 몇 명을 채우시려는지 몰라도 어떻습니까?"
넌지시 흘리는 인후상의 말에 묵객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흑립을 치켜 올린 묵객은 인후상에게 다른 사람을 가리켰다.
"아니…! 저, 자(者)!"
흑립 사이에 나타난 묵객은 설 무영이었다. 설 무영의 뒤에는 유끼꼬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설무영이 손가락질 한 곳에는 도화목 그늘! 며칠을 씻지 않았는지 꾀죄죄한 행색의 괴인이 도화목 그늘에 외따로 앉아있었다. 흐트러진 장발 사이로 가끔 세인들을 바라보는 괴인은 초췌한 청년의 얼굴이었다. 허나 눈빛은 광야의 굶주림에 찌든 이리와도 같았다.
봉두난발한 청년을 힐끗 바라 본 인후상에게서 간교한 웃음이 흘러 나왔다.
"헤헤…! 손님! 독고야(督孤野)는 비쌉니다요. 본인에게 빚도 있는 자라서....... 헤헤!"
"얼마…?"
표정 변화 없는 설 무영이 청년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며 물었다.
"헤헤…! 삼, 아니 사백 량은 받아야......."
".........!?"
설 무영은 묵묵히 머리를 가로 저었다.
"애구! 그 이하로 안 되는데. 헤헤…! 할 수 없죠. 벌써 본인과 이십 명 째 거래하는데 삼백 량만 주십쇼."
".........!"
설 무영은 두말하지 않고 인후상에게 은전을 주었다. 은전을 받아든 인후상이 도화목 아래로 갔다. 독고야라는 청년은 인후상과 몇 마디 말을 주고받은 후 먼지도 털 생각을 잊은 채 부스스 먼지를 일으키며 설 무영에게 다가왔다. 설 무영이 묵묵히 물었다.
"왜 목숨을 파는가?"
".......!"
힐끗 반항적으로 설 무영을 바라본 독고야는 어깨를 후르르 떨었다. 감히 거역할 수 없는 패도가 설 무영에게서 흘러나온 것이다.
"노모의 병환을 고치기 위해서요."
"후회하는가?"
설 무영의 기품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이제 후회는 없습니다........"
설 무영은 독고야의 한마디를 들은 후 품안에서 오백량짜리 전표를 꺼내 주었다.
"이것으로 가솔(家率)과 이별하고 한 달 후에 감숙(甘肅) 맥적산 고묘(古廟)로 오거라! 마음이 변하면 안와도 좋다."
".......!"
독고야는 의아스런 눈초리로 그를 바라봤다.
"가자!"
설 무영은 몸을 돌리며 유끼꼬를 향해 말하고는 걸어갔다. 그런 식으로 설 무영이 오늘 하루 동안 만에도 무인을 고용한 숫자는 오십여 명에 이른다. 설 무영과 유끼꼬는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독고야를 뒤로 한 채 인파속으로 사라졌다.
개봉에서 사라진 설 무영과 유끼꼬의 흔적은 점차 북상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호북(湖北)의 성도(星都)인 무한(武漢), 하남의 정주(鄭州), 화북(華北)의 대동(大同), 협서(협서)의 화산(華山)과 서안(西安), 영하(寧夏)의 은천(銀川)을 거처 감숙(甘肅)의 난주(蘭州)에 이르렀다. 그들은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인간시장에는 어김없이 흔적을 남겼다.
그들이 북상함에 따라 초록색을 끌고 가는 춘풍과 함께 꽃망울들이 쫓아 올라갔다. 봄소식과 함께 아울러 감숙성에는 새로운 희소식이 퍼져 나오고 있었다. 가족에게 황금을 내어놓고 하나, 둘씩 눈가림을 당하고 사라졌던 목공, 석공, 이름난 도공(圖工)들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들을 맞이한 가족들은 죽은 사람이 돌아온 양 반가워했다.
그런데 옥문현과 천수현 일대에는 낯선 무리의 묵객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언제나 여러 민족의 상인들이 들끓는 옥문현 일대는 더 더욱 인파로 혼잡하였다. 대장장이 염노야 부부가 양지쪽에서 햇볕을 쪼이고 있었다.
"무슨 전장이라도 벌어졌남?"
지나다니는 묵개들을 바라보고 영노야의 부인 번(繁)부인이 물었다.
"글쎄.......?"
그들은 의구심을 일구며 묵객들을 바라봤다. 묵객들은 하나같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일정하게 맥적산을 향해 가고 있었다. 입을 굳게 닫은 그들은 유계에서 온 사람처럼 세인들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고 터질 듯 하는 긴장감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흔적도 오래지 않아 사라지고 없어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둠을 뚫고 나타난 한명의 청년이 부리나케 맥적산을 향하여 달리고 있었다. 청년은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너무 늦었다. 허지만, 난 가야 된다. 어차피 죽을 목숨, 그에게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청년은 비 오듯 땀을 흘리고 있었으며 의복은 모두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늦었다고 안 받아주면 차라리 목숨을 끊으리라."
청년은 어금니를 바드득! 거리며 물었다. 그가 맥적산을 올라 당도한 곳은 고대의 석조건물의 잔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수백여 개의 고묘가 널려 있는 분지였다.
".........!?"
헌데 그곳에는 괴이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둠속을 밝히는 월광아래 천여 명의 묵인들이 석상처럼 서 있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없이 침묵을 지키는 고요한 적막이 흐르고 있었다. 단지 그들이 말을 잃고 한곳을 응시하는 곳이 있었다.
청년은 숨을 고루며 앞을 바라봤다. 묵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정면의 암석위에는 청년에게 목숨 값 이외에 오백 냥의 전표를 끊어준 흑립의 흑객이 우뚝 서 있었다. 흑객 뒤에는 복면을 한 또 하나 흑객이 서 있었다.
많은 인원이 있건만 누구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이 두 명의 흑객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명의 흑객! 그들은 해남으로 부터 북상해온 설 무영과 유끼꼬였다. 한 가닥 미풍이 불어와 설 무영의 흑포를 나부끼게 하였다. 문득 유끼꼬가 한발 앞에 나서서 사자후를 내질렀다.
"난 은비살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포기를 희망하는 자는 앞으로 나오라!"
"........!"
그녀의 사자후는 오백년 이상의 내공과 천면환영신술(千面幻影神術)롤 목소리를 변성(變聲)한 것이었다. 고막을 파열시킬 듯 하는 음파에 묵인들은 몸서리를 쳤다. 한동안 다시 침묵이 흘렀다. 고심하던 묵인들 중 하나, 둘씩 앞으로 나온 사람이 열두 명에 달했다.
"또 없는가?"
유끼꼬의 날카로운 고성이 밤공기를 뚫고 퍼져갔다.
"포기하는 자에게는 연유도 묻지 않고, 은전과 전표를 반환치 않고 가족에게 돌아가도 된다. 또 포기를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나와라!"
잠시 시간이 흘러도 더 이상은 포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포기를 희망하는 자는 돌아가 가족을 돌봐라!"
".......!"
포기한 자들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유끼꼬가 다시 일갈하였다.
"그럼, 도존(桃尊)께서 말씀이 있겠다."
도화성의 성주를 일컬어 도존이라 칭하는 말이었다. 흑립 속에 표정을 감춘 채 묵묵히 주시하고 있던 설 무영이 입을 열었다.
"다시 말하지만, 포기할 기회를 다시 주겠다."
".........!"
설 무영은 흑립 아래로 묵인들을 내려다보았다. 어느 누구도 동요하지 않고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본 좌는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同苦同樂)할 사람이다. 여기 모인 여러분은 억눌리고 세인들로부터 억눌리고 따돌림 받고 천대받았던 사람들로 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한다.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죽을 각오로 행동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낙오자(落伍者)는 언제나 돌아 갈 것이다. 더 이상의 할 말은 없다."
".........!"
숨소리마저 감춘 어둠속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그들은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활화산처럼 이글이글 타올랐다.
"여러분을 이 시간부터 도화성의 사자단(獅子團)이라한다. 가자!"
설 무영과 유끼꼬는 그들을 이끌고 바람처럼 맥적산으로 올라갔다. 천여 명의 묵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는 어둠과 바람과 적막이 깃들었다.
그날 이후로 감숙성 세인들은 도화성 근처에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고 다가가지 못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진과 기관 장치로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도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이었다. 도화성에서 굶어죽은 사마씨(司馬氏) 일가족의 유령이 돌아다닌다는 풍문까지 나돌았다.
도화성(桃花城).
외곽에서 보이는 도화성은 높은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어 넝쿨로 뒤덮인 고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허지만, 내부는 의외로 넓고 이십여 채의 규모가 큰 각(閣)과 루(樓), 그리고 헌(軒)으로 이루어져 있다.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의외로 내부는 견고한 대리석과 만년한철(萬年寒鐵), 자단목(紫檀木)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단지 내부의 중요 부분만 흑오목(黑烏木), 산호(珊瑚), 상아(象牙), 흑옥(黑玉)등과 백호피(白虎皮)가 있으나 결코 사치스럽다기보다는 고풍스럽고 단아한 분위기가 들었다. 각 건물마다 천장 일부에는 유리와 수정을 소재로 한 자연적인 채광이 이루어져 햇살과 달빛이 실내를 밝게 비추었다.
도화성의 북쪽 성곽에 잇닿은 설난루(雪蘭樓).
누각의 창틈은 약간 열려져 있었는데 그 틈으로 달빛이 은가루처럼 스며든다.
스 읏!
문득 월광과 함께 하나의 그림자가 조용히 누각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누각 안에는 하나의 그림자가 황촉불의 빛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적막하고도 쓸쓸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십대를 갓 넘은 여인인데 청아한 자태에는 희디흰 능라의(綾羅衣)를 걸치고 있었다.
조용히 자수(刺繡)를 놓고 있는 여인의 자태는 그대로 한 송이 옥잠화(玉簪花)을 보는 듯했다. 하얀 월광에 피어나는 고결하고 깨끗한 상아빛 옥잠화라고나 할까! 다홍빛을 띤 여인의 옥용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다림에 지친 애틋한 감흥도 그녀의 옥용엔 서려 있었다.
여인이 움직일때마다 능라의에 감추어진 세류요(細柳腰)같은 나신의 자태가 보일 듯 나긋나긋한 윤곽이 들어났다.
"아........!"
여인은 지루한 시간을 견디다 못해 백옥을 조각한 듯이 가녀린 양 팔을 들어 기지개를 폈다. 허무한 시간에 대한 표현일는지 아니면 기다림의 지루함일는지 그 누구도 모른다. 여인의 기다림이란 연모지정(戀慕之情)의 촛불이었다.
언뜻 여인의 봉옥이 흔들리는 황 촛불에 완연히 들어났다. 보조개가 깊게 패여 옥잠화 같은 봉옥은 설난미화(雪蘭美花) 소류진(昭流珍)이었다. 모란장원의 파멸과 가족들이 멸살된 후 설 무영의 도움을 받은 그녀였다. 피붙이 하나 없는 사고무친(四顧無親)의 그녀가 의지할 사람이라고 설 무영 뿐이었다.
소류진은 설 무영이 전도련과 정을 나눈 사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묘한 질투심이 일어났었다. 허지만, 비슷한 처지에 처한 전도련인지라 서로 의지하게 되었고 자매처럼 지내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한 쪽에는 은연중에 쌓여가는 멍울이 있었다. 불쑥 백색요대(白色腰帶)와 천잠의(天蠶衣)를 던져 놓고 사라진 채 나타나지 않는 설 무영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이었다.
간혹 그녀는 설 무영의 소식을 십천간룡과 세 명의 고아 친구들에 들을 수는 있었다. 도화성으로 옮긴 것도 그들의 도움과 설 무영의 안배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그녀의 몸을 지켜주는 천잠보의도 아니고, 안락한 도화성의 생활도 아니었다. 누군가와는 희로애락을 같이하고 싶을 뿐이었다.
바람도 없는 월야이건만 창문에 드리워진 벽사(碧紗)가 일렁거렸다.
".......!?"
무심코 소류진의 시선이 창문을 향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등 뒤에서 그녀의 봉목을 가렸다.
"누…! 누구......?"
그녀는 화들짝 놀라 교구를 움츠렸다. 도화성에는 외부인이 들어올 수도 있을 수도 없다. 커다란 성에는 전도련과 어린영식 백건우, 그리고 하인들뿐이었다. 굳이 있다면 가끔 들리는 십천간룡과 설 무영의 고아 친구들뿐이었다.
더욱이나 그 누구도 소류진의 봉옥을 가리는 행동을 할 자는 없었다. 그녀는 등 뒤에서 두 눈을 가린 자의 심장소리가 뚝딱거리고 들려오는 것 같았다.
"혹시…?"
소류진은 막연한 추측으로 기다림의 대상자를 그려봤다.
"영랑…!?"
그녀의 한마디에 두 눈을 가렸던 손이 풀어졌다. 황 촛불이 흔들리는 그녀 앞에 싱그러운 미소를 띤 헌헌장부(軒軒丈夫)가 서있었다.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오관이 반듯한 용모, 지극한 청기가 흐르는 영준한 모습이나 전보다 검게 그을린 청년, 설 무영이었다. 달빛을 등진 그의 모습이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다.---------------------------
"하하하…! 그러고 보니 네놈은 강호무림의 표적 흑설매였구나!"
".........!"
투혼사의 말을 듣고 모두들 놀라며 설 무영을 주시하였다. 철륜광마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폭갈을 하였다.
"그…! 그렇다면 본문의 소문주 신투귀면(神偸鬼面)을 주살한 자란 말이냐?"
설 무영은 절혼괴도(切魂傀盜)의 독수에 당하고 그에게 황금선녀상을 건네준 후 목숨을 다한 신투귀면 허수(許手)를 말함을 알았다. 설 무영은 냉담하게 내 뱉었다.
"난 신투귀면을 죽이지 않았소."
"네놈이 한 짓인 줄 뻔히 알고 있는데, 변명이냐?"
투혼사가 게거품을 입에 물 듯 내뱉었다. 설 무영이 빠르게 답변하였다.
"신투귀면은 절혼괴도(切魂傀盜) 마석주(麻夕舟)에게 당했소. 절혼괴도는 내손에 사라지고, 그들의 시신은 소출이 거두어 옥문현 송림 야산에 안장하였소."
"이놈아! 너의 살수는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발뺌을 할 것이냐?"
"헛! 참........"
"노부들이 너희들을 경시한 것이 잘못이다. 굳이 무력에 의해서만이 물러간다면 어쩔 수 없구나."
시혼채의 말을 신호로 그들은 설 무영과 유끼꼬를 빙 둘러싸고 협공자세를 취하였다. 설 무영은 막무가내로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그들을 더 마주할 의기를 잃었다. 불쑥 일갈과 함께 철륜광마가 설 무영을 향해 도(刀)를 휘저었다.
"놈! 너의 목으로 소문주의 원혼을 달래마!"
스스슥 휭!
도광이 번뜩이며 맹렬한 도강이 설 무영의 목을 자를 위세로 그어왔다. 그때 검은 그림자가 설 무영의 앞을 막아섰다. 강렬한 은빛 강막이 형성되고 도강(刀剛)을 가르며 비늘 조각 같은 장력이 철류광마의 전신을 주살해 갔다.
"헛! 어린살음장(御麟殺陰掌)…!?"
한마디 외마디를 지른 철륜광마가 다섯 걸음을 뒤로 물러섰다. 어린살음장을 반출한 것은 유끼꼬였다. 의복이 갈기갈기 찢긴 철륜광마의 가슴은 장흔과 피멍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봉황쌍후(鳳凰雙女) 흑봉황(黑鳳凰)의 절전된 절기를 보게 되다니.......?)
시혼채가 중얼거리며 유끼꼬를 향하여 협공을 하였다. 시혼채의 몸이 반원을 그리며 유끼꼬의 옆구리를 주살해 갔다. 또한 황포의 보두괴도 유끼꼬를 협살하러 몸을 날렸다.
"어딜........!"
유끼꼬는 좌수의 어린살비조(御麟殺飛爪)로 다섯줄기의 강기를 일으켜 보두괴의 가슴을 가르고, 동시에 우수로 철륜광마를 주살하면서 좌수로 장막을 일으켜 시혼채와 맞서갔다.
"노부들이 계집 하나에 쩔쩔매다니.......!"
철륜광마는 분통을 터트리며 유끼꼬의 어린살음장을 장막으로 맞서며 흑도(黑刀)를 빼어들었다.
스 르르릉!
그때 유끼꼬의 어린살비조의 예기에 어깻죽지가 잘린 보두괴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으…악!"
보두괴는 선혈이 흐르는 어깻죽지를 붙잡고 쓸어졌다. 유끼꼬는 그들을 맞이하여 그렇게 이십여 차례의 초식을 주고받았다. 복면 속의 유끼꼬 표정은 읽을 수 없었고, 다만 그녀의 무공에 그들은 점차 깊은 상처를 당하고 있었다.
"그만~!"
묵묵히 바라보고 있던 설 무영의 입에서 일갈이 터졌다. 검은 무복의 유끼꼬는 설 무영 앞에 좌 무릎을 꿇어 좌궤(左跪)하였고, 그들은 충혈 된 눈으로 설 무영을 직시하였다. 설 무영은 품안에서 공령하영환을 꺼내 시혼채 앞에 내던지고 말했다.
"함부로 살생을 원하지 않소. 다만, 이것을 전달하고 자초지종을 알려주려 했을 뿐인데, 이렇도록 거부한다면 그냥 물건만 주고 가겠소."
"아니, 이…! 이것은 공령하영환.......!"
두 호법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그들의 전대 문주 환영제(幻影帝) 야명(冶鳴)과 함께 사라진 공령하문 문주의 신표였다. 뱉어 내듯이 말을 마친 설 무영과 유끼꼬는 되돌아서 가고 있었다.
"자, 잠간만 대협께서는 걸음을 멈추어 주시오!"
철륜광마가 황급히 설 무영을 불러 세웠다.
"아직도 내게 볼일이 있소?"
뒤돌아선 설 무영이 물었다. 철륜광마가 급히 설 무영 앞을 막아서서 포권을 하였다.
"노부들이 결례를 하였습니다. 노부가 문주께 모시겠으니 안으로 드시지요."
".......?"
설 무영은 그들의 태도가 갑자기 변하는 것에 어리둥절하였다. 설 무영은 그들을 따라 그들의 의사당(議事堂)인 자공각(紫空閣)으로 향했다. 자공각 안에는 태사위에 사십 전후의 중년인과 좌우로 두 명의 나이 지긋한 무인이 양립하고 있었다.
그들은 문주인 야투일왕(夜偸一王) 저명손(楮冥飡)과 법계당주(法戒堂主)인 등천일노(騰天一
老), 군무당주(軍武堂主)인 승무호군(昇鶩虎君)이었다. 철륜광마가 야투일왕에게 다가가 자초지종을 말하고 공비하령환을 건네주었다.
공령하영환을 받아든 야투일왕은 기겁을 하여 황급히 태사위에서 내려와 설 무영 앞에 부복하는 것이었다.
"후배들의 과오에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야투일왕에 이어 당주와 호법이 그 앞에 부복을 하였다. 설 무영은 졸지에 일어난 상황에 당황하여 그들을 만류하였다.
"후배라니 웬 말씀입니까? 단지 소부는 신표를 전하고, 한 가지 청이 있어 들린 것뿐인데........"
"아닙니다. 전대 문주님의 신표를 갖고 있다면, 그 분의 독문절학을 전수 받았을 테이니 저희들에게는 사형(師兄)이십니다."
설 무영이 야투일왕의 말을 들으니 이치에 어긋나는 말이 아니었다.
"그건 사실이오. 소부는 사조(師祖)이신 환영일신공(幻影一神公)의 환영비혼신공(幻影秘魂神功)의 모든 비급무공도 연마하였소!"
"헉! 절전된 사조의 무공을....... 그렇다면 사, 사숙(師숙) 원로이십니다. 불초 후배들이 모르고 저지른 과오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만 저희들은 전대 문주와 함께 신표도 사라지고 소문주의 행방이 묘연하기에 봉문을 하고 있던 지경으로 저지른 우매한 행동이었습니다. 전대 문주께서는 어찌 되셨는지 후배들은 귀담아 듣겠습니다."
"환영제(幻影帝) 야명(冶鳴)께서는........"
설 무영은 공령하영환을 취하게 된 경과와 환영제와 환영일신공과의 기연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들은 그때서야 사조들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풀고 처연한 표정을 지었다. 야투일왕이 두 손으로 공령하영환을 다시 설 무영에게 건네며 말했다.
"한 가지 청이라고 하였는데 청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는 문주의 명령입니다."
"문주의 명령이라니…?"
또 다시 의구심에 든 설 무영에게 야투일왕이 설명을 하였다.
"공령하문의 오래된 묵계가 있습니다. 사조의 무공비급을 전수 받고 문주의 신표를 소유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바로 공령하문의 문주가 되어 공령하문을 강호에 절대문파로 만든다는 것이지요. 또한 소문주가 없는 상황에서 후배 저명손은 임시 문주를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로 사숙께서는 문주로서 말씀하여 주시면 혼신을 다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야투일왕은 진중하고 침중한 표정으로 변하여 말하였다. 설 무영은 창졸지간에 중원에서 개방 다음가는 연락망과 소식통을 갖고 있는 공령하문의 문주가 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야투일왕께서는 아수천에 대해서 알고 있소?"
"허 헛......!"
야투일왕이 내쉬던 숨을 들이키며 놀랬다. 그는 설 무영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아직은 젊은 청년이건만 완벽한 균형의 골격, 한없는 지혜와 현기의 눈빛, 초 절정고수에서만 흐르는 무형기도는 가히 종사의 기품이 넘치고 있었다. 그런 설 무영에게서 암흑 속에 감추어진 절대 사마의 제왕인 아수라에 관한 이야기가 서슴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었다.
"속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문주에 관한 건으로 봉문하고 있는 야투일왕도 아수천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는 바였다. 허지만 그는 알고 있는 사안만 더듬더듬 털어놓았다.
이미 아수라에 관해 알고 있는 설 무영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는 것은 없었다. 굳게 입을 닫은 채 듣고 있던 설 무영이 태산같이 결연한 눈빛으로 말하였다.
"지금부터 아수라의 지부천의 위치와 행동, 아수천에 관한 무림의 동태, 등 아수천에 관한 모든 것을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하시오!"
지엄한 문주의 한마디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설 무영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아수천에 관해 식견을 낱낱이 알려주었다.
천황혼마전의 고인(古人) 파슬은 말했었다. 마신환경재림(魔신還鏡再臨)이지만, 천룡탄파마경(天龍誕破魔鏡), 악마의 신이 거울을 통해 환생하지만, 천룡이 태어나 악마의 신과 거울을 부순다고 하였다.
개봉(開封).
당금 후주(後周) 황실의 도읍지.
남하문(南夏門) 근처에는 상점들과 노상이 즐비하고 오가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노후한 상점에서 고루거각을 연상케 하는 상점과 기루, 객루들이 뒤섞여 있는 거리에는 떠돌이 장사꾼에 행상까지 목청을 돋우는 상가는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이다.
거리를 오가는 세인들은 농, 공, 행상을 비롯하여 한족, 몽골족, 남만족, 고려인, 색목인을 비롯하여 동영인의 모습까지 천태만별의 모습이 보인다. 복잡한 거리가 한눈에 보이는 성벽 가까운 곳에는 장정 여럿이 안아도 모자랄 몇 백 년을 버티어온 도화목이 한그루 보인다.
얼마 지나면 춘풍이 다가옴을 느끼는 도화목의 가지에 꽃망울이 기지개를 펴는 준비가 한창이다. 헌데 도화목 아래는 각양각색의 복장을 한 세인들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들 중에는 검과 도를 찬 낭인이 있는가 하면 추와 창, 편 등을 장한과 체구가 작은 여인들도 눈에 뜨였다.
이곳은 다름 아닌 인간시장이었다. 당금 시대는 흉년과 기근이 연속되고, 혈난의 전국시대에 각국의 병군에서 낙오한 군사들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무림 군소종파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갈 곳을 잃은 무인들마저 가세하여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인간시장을 찾아 목숨을 팔고 있었다.
그들이 팔려고 하는 것은 노예, 하인, 처첩을 비롯하여 무인도 있다. 대체로 중개인들이나, 노예상인들이지만, 스스로 자신을 팔고 있는 자들도 있다.
"월하(月河)의 전추라(塞秋羅), 벽안금발(壁眼金髮)의 색목여인, 흑안다즙(黑眼多汁)의 몽골녀에서 청순가련(淸純佳緣)한 고려여인까지 모두 있습니다! 자! 흥정을 하세요......."
형형색색의 복장을 한 여인들을 세워놓고 목청을 돋우는 노예상인 옆에서는 또 다른 흥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피혁으로 외눈을 가린 장한이 외치고 있었다.
"몽골과의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도백철(刀魄喆)입니다. 백 오십 량으로 목숨을 지키실 분, 없어요? 없으면 백사십 량을 부른 이분에게 갑니다. 자! 자! 흥정들 하세요. 늦기 전에....... 이 인후상(印吼商)은 틀림없는 거래만 합니다."
황금으로 무인과 자객의 목숨을 사고파는 시장이었다.
"여봐요!"
사십 전후의 중년여인이 외눈의 사나이 뒤에 서있는 도를 든 오십대의 무인 도백철을 바라보며 꽥! 소리를 질렀다. 외눈의 인후상이란 사나이가 굽실거렸다.
"네! 네. 부인......."
"나이가 많아 힘이나 쓰겠어요?"
인후상이 두툼한 입가에 비소를 지으며 되물었다.
"밤에만 쓰시려고……?"
"와하하하.........!"
인후상의 비아냥거림에 구경하고 있던 세인들의 폭소가 터져 나왔다.
"빌어먹을 인간~!"
중년여인은 냉갈을 터트리며 디룩디룩 살찐 몸을 이끌고 사라졌다. 중년여인이 사라지자, 인후상이 흑립을 쓰고 바라보고 있는 묵객에게 간사한 미소를 흘리며 말했다.
"대협께서는 몇 명을 채우시려는지 몰라도 어떻습니까?"
넌지시 흘리는 인후상의 말에 묵객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흑립을 치켜 올린 묵객은 인후상에게 다른 사람을 가리켰다.
"아니…! 저, 자(者)!"
흑립 사이에 나타난 묵객은 설 무영이었다. 설 무영의 뒤에는 유끼꼬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설무영이 손가락질 한 곳에는 도화목 그늘! 며칠을 씻지 않았는지 꾀죄죄한 행색의 괴인이 도화목 그늘에 외따로 앉아있었다. 흐트러진 장발 사이로 가끔 세인들을 바라보는 괴인은 초췌한 청년의 얼굴이었다. 허나 눈빛은 광야의 굶주림에 찌든 이리와도 같았다.
봉두난발한 청년을 힐끗 바라 본 인후상에게서 간교한 웃음이 흘러 나왔다.
"헤헤…! 손님! 독고야(督孤野)는 비쌉니다요. 본인에게 빚도 있는 자라서....... 헤헤!"
"얼마…?"
표정 변화 없는 설 무영이 청년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며 물었다.
"헤헤…! 삼, 아니 사백 량은 받아야......."
".........!?"
설 무영은 묵묵히 머리를 가로 저었다.
"애구! 그 이하로 안 되는데. 헤헤…! 할 수 없죠. 벌써 본인과 이십 명 째 거래하는데 삼백 량만 주십쇼."
".........!"
설 무영은 두말하지 않고 인후상에게 은전을 주었다. 은전을 받아든 인후상이 도화목 아래로 갔다. 독고야라는 청년은 인후상과 몇 마디 말을 주고받은 후 먼지도 털 생각을 잊은 채 부스스 먼지를 일으키며 설 무영에게 다가왔다. 설 무영이 묵묵히 물었다.
"왜 목숨을 파는가?"
".......!"
힐끗 반항적으로 설 무영을 바라본 독고야는 어깨를 후르르 떨었다. 감히 거역할 수 없는 패도가 설 무영에게서 흘러나온 것이다.
"노모의 병환을 고치기 위해서요."
"후회하는가?"
설 무영의 기품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이제 후회는 없습니다........"
설 무영은 독고야의 한마디를 들은 후 품안에서 오백량짜리 전표를 꺼내 주었다.
"이것으로 가솔(家率)과 이별하고 한 달 후에 감숙(甘肅) 맥적산 고묘(古廟)로 오거라! 마음이 변하면 안와도 좋다."
".......!"
독고야는 의아스런 눈초리로 그를 바라봤다.
"가자!"
설 무영은 몸을 돌리며 유끼꼬를 향해 말하고는 걸어갔다. 그런 식으로 설 무영이 오늘 하루 동안 만에도 무인을 고용한 숫자는 오십여 명에 이른다. 설 무영과 유끼꼬는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독고야를 뒤로 한 채 인파속으로 사라졌다.
개봉에서 사라진 설 무영과 유끼꼬의 흔적은 점차 북상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호북(湖北)의 성도(星都)인 무한(武漢), 하남의 정주(鄭州), 화북(華北)의 대동(大同), 협서(협서)의 화산(華山)과 서안(西安), 영하(寧夏)의 은천(銀川)을 거처 감숙(甘肅)의 난주(蘭州)에 이르렀다. 그들은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인간시장에는 어김없이 흔적을 남겼다.
그들이 북상함에 따라 초록색을 끌고 가는 춘풍과 함께 꽃망울들이 쫓아 올라갔다. 봄소식과 함께 아울러 감숙성에는 새로운 희소식이 퍼져 나오고 있었다. 가족에게 황금을 내어놓고 하나, 둘씩 눈가림을 당하고 사라졌던 목공, 석공, 이름난 도공(圖工)들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들을 맞이한 가족들은 죽은 사람이 돌아온 양 반가워했다.
그런데 옥문현과 천수현 일대에는 낯선 무리의 묵객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언제나 여러 민족의 상인들이 들끓는 옥문현 일대는 더 더욱 인파로 혼잡하였다. 대장장이 염노야 부부가 양지쪽에서 햇볕을 쪼이고 있었다.
"무슨 전장이라도 벌어졌남?"
지나다니는 묵개들을 바라보고 영노야의 부인 번(繁)부인이 물었다.
"글쎄.......?"
그들은 의구심을 일구며 묵객들을 바라봤다. 묵객들은 하나같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일정하게 맥적산을 향해 가고 있었다. 입을 굳게 닫은 그들은 유계에서 온 사람처럼 세인들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고 터질 듯 하는 긴장감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흔적도 오래지 않아 사라지고 없어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둠을 뚫고 나타난 한명의 청년이 부리나케 맥적산을 향하여 달리고 있었다. 청년은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너무 늦었다. 허지만, 난 가야 된다. 어차피 죽을 목숨, 그에게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청년은 비 오듯 땀을 흘리고 있었으며 의복은 모두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늦었다고 안 받아주면 차라리 목숨을 끊으리라."
청년은 어금니를 바드득! 거리며 물었다. 그가 맥적산을 올라 당도한 곳은 고대의 석조건물의 잔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수백여 개의 고묘가 널려 있는 분지였다.
".........!?"
헌데 그곳에는 괴이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둠속을 밝히는 월광아래 천여 명의 묵인들이 석상처럼 서 있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없이 침묵을 지키는 고요한 적막이 흐르고 있었다. 단지 그들이 말을 잃고 한곳을 응시하는 곳이 있었다.
청년은 숨을 고루며 앞을 바라봤다. 묵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정면의 암석위에는 청년에게 목숨 값 이외에 오백 냥의 전표를 끊어준 흑립의 흑객이 우뚝 서 있었다. 흑객 뒤에는 복면을 한 또 하나 흑객이 서 있었다.
많은 인원이 있건만 누구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이 두 명의 흑객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명의 흑객! 그들은 해남으로 부터 북상해온 설 무영과 유끼꼬였다. 한 가닥 미풍이 불어와 설 무영의 흑포를 나부끼게 하였다. 문득 유끼꼬가 한발 앞에 나서서 사자후를 내질렀다.
"난 은비살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포기를 희망하는 자는 앞으로 나오라!"
"........!"
그녀의 사자후는 오백년 이상의 내공과 천면환영신술(千面幻影神術)롤 목소리를 변성(變聲)한 것이었다. 고막을 파열시킬 듯 하는 음파에 묵인들은 몸서리를 쳤다. 한동안 다시 침묵이 흘렀다. 고심하던 묵인들 중 하나, 둘씩 앞으로 나온 사람이 열두 명에 달했다.
"또 없는가?"
유끼꼬의 날카로운 고성이 밤공기를 뚫고 퍼져갔다.
"포기하는 자에게는 연유도 묻지 않고, 은전과 전표를 반환치 않고 가족에게 돌아가도 된다. 또 포기를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나와라!"
잠시 시간이 흘러도 더 이상은 포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포기를 희망하는 자는 돌아가 가족을 돌봐라!"
".......!"
포기한 자들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유끼꼬가 다시 일갈하였다.
"그럼, 도존(桃尊)께서 말씀이 있겠다."
도화성의 성주를 일컬어 도존이라 칭하는 말이었다. 흑립 속에 표정을 감춘 채 묵묵히 주시하고 있던 설 무영이 입을 열었다.
"다시 말하지만, 포기할 기회를 다시 주겠다."
".........!"
설 무영은 흑립 아래로 묵인들을 내려다보았다. 어느 누구도 동요하지 않고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본 좌는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同苦同樂)할 사람이다. 여기 모인 여러분은 억눌리고 세인들로부터 억눌리고 따돌림 받고 천대받았던 사람들로 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한다.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죽을 각오로 행동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낙오자(落伍者)는 언제나 돌아 갈 것이다. 더 이상의 할 말은 없다."
".........!"
숨소리마저 감춘 어둠속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그들은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활화산처럼 이글이글 타올랐다.
"여러분을 이 시간부터 도화성의 사자단(獅子團)이라한다. 가자!"
설 무영과 유끼꼬는 그들을 이끌고 바람처럼 맥적산으로 올라갔다. 천여 명의 묵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는 어둠과 바람과 적막이 깃들었다.
그날 이후로 감숙성 세인들은 도화성 근처에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고 다가가지 못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진과 기관 장치로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도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이었다. 도화성에서 굶어죽은 사마씨(司馬氏) 일가족의 유령이 돌아다닌다는 풍문까지 나돌았다.
도화성(桃花城).
외곽에서 보이는 도화성은 높은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어 넝쿨로 뒤덮인 고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허지만, 내부는 의외로 넓고 이십여 채의 규모가 큰 각(閣)과 루(樓), 그리고 헌(軒)으로 이루어져 있다.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의외로 내부는 견고한 대리석과 만년한철(萬年寒鐵), 자단목(紫檀木)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단지 내부의 중요 부분만 흑오목(黑烏木), 산호(珊瑚), 상아(象牙), 흑옥(黑玉)등과 백호피(白虎皮)가 있으나 결코 사치스럽다기보다는 고풍스럽고 단아한 분위기가 들었다. 각 건물마다 천장 일부에는 유리와 수정을 소재로 한 자연적인 채광이 이루어져 햇살과 달빛이 실내를 밝게 비추었다.
도화성의 북쪽 성곽에 잇닿은 설난루(雪蘭樓).
누각의 창틈은 약간 열려져 있었는데 그 틈으로 달빛이 은가루처럼 스며든다.
스 읏!
문득 월광과 함께 하나의 그림자가 조용히 누각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누각 안에는 하나의 그림자가 황촉불의 빛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적막하고도 쓸쓸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십대를 갓 넘은 여인인데 청아한 자태에는 희디흰 능라의(綾羅衣)를 걸치고 있었다.
조용히 자수(刺繡)를 놓고 있는 여인의 자태는 그대로 한 송이 옥잠화(玉簪花)을 보는 듯했다. 하얀 월광에 피어나는 고결하고 깨끗한 상아빛 옥잠화라고나 할까! 다홍빛을 띤 여인의 옥용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다림에 지친 애틋한 감흥도 그녀의 옥용엔 서려 있었다.
여인이 움직일때마다 능라의에 감추어진 세류요(細柳腰)같은 나신의 자태가 보일 듯 나긋나긋한 윤곽이 들어났다.
"아........!"
여인은 지루한 시간을 견디다 못해 백옥을 조각한 듯이 가녀린 양 팔을 들어 기지개를 폈다. 허무한 시간에 대한 표현일는지 아니면 기다림의 지루함일는지 그 누구도 모른다. 여인의 기다림이란 연모지정(戀慕之情)의 촛불이었다.
언뜻 여인의 봉옥이 흔들리는 황 촛불에 완연히 들어났다. 보조개가 깊게 패여 옥잠화 같은 봉옥은 설난미화(雪蘭美花) 소류진(昭流珍)이었다. 모란장원의 파멸과 가족들이 멸살된 후 설 무영의 도움을 받은 그녀였다. 피붙이 하나 없는 사고무친(四顧無親)의 그녀가 의지할 사람이라고 설 무영 뿐이었다.
소류진은 설 무영이 전도련과 정을 나눈 사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묘한 질투심이 일어났었다. 허지만, 비슷한 처지에 처한 전도련인지라 서로 의지하게 되었고 자매처럼 지내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한 쪽에는 은연중에 쌓여가는 멍울이 있었다. 불쑥 백색요대(白色腰帶)와 천잠의(天蠶衣)를 던져 놓고 사라진 채 나타나지 않는 설 무영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이었다.
간혹 그녀는 설 무영의 소식을 십천간룡과 세 명의 고아 친구들에 들을 수는 있었다. 도화성으로 옮긴 것도 그들의 도움과 설 무영의 안배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그녀의 몸을 지켜주는 천잠보의도 아니고, 안락한 도화성의 생활도 아니었다. 누군가와는 희로애락을 같이하고 싶을 뿐이었다.
바람도 없는 월야이건만 창문에 드리워진 벽사(碧紗)가 일렁거렸다.
".......!?"
무심코 소류진의 시선이 창문을 향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등 뒤에서 그녀의 봉목을 가렸다.
"누…! 누구......?"
그녀는 화들짝 놀라 교구를 움츠렸다. 도화성에는 외부인이 들어올 수도 있을 수도 없다. 커다란 성에는 전도련과 어린영식 백건우, 그리고 하인들뿐이었다. 굳이 있다면 가끔 들리는 십천간룡과 설 무영의 고아 친구들뿐이었다.
더욱이나 그 누구도 소류진의 봉옥을 가리는 행동을 할 자는 없었다. 그녀는 등 뒤에서 두 눈을 가린 자의 심장소리가 뚝딱거리고 들려오는 것 같았다.
"혹시…?"
소류진은 막연한 추측으로 기다림의 대상자를 그려봤다.
"영랑…!?"
그녀의 한마디에 두 눈을 가렸던 손이 풀어졌다. 황 촛불이 흔들리는 그녀 앞에 싱그러운 미소를 띤 헌헌장부(軒軒丈夫)가 서있었다.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오관이 반듯한 용모, 지극한 청기가 흐르는 영준한 모습이나 전보다 검게 그을린 청년, 설 무영이었다. 달빛을 등진 그의 모습이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다.---------------------------

최고관리자
| 가입일 | 2016-08-11 | 접속일 | 2024-12-28 |
|---|---|---|---|
| 가입일 | 2016-08-11 | ||
| 접속일 | 2024-12-28 | ||
| 서명 | 황진이-19금 성인놀이터 | ||
| 태그 | |||
| 황진이-무료한국야동,일본야동,중국야동,성인야설,토렌트,성인야사,애니야동
야동토렌트, 국산야동토렌트, 성인토렌트, 한국야동, 중국야동토렌트, 19금토렌트 |
|||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