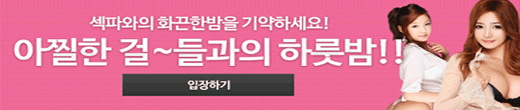해는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다. 넓디 넓은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바위섬. 그 바위섬의 작은 동굴 안에, 우리 나라에서 몰라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잘 나가는 최고 미녀 배우 홍여랑과 알몸인채, 이러고 있다는 사실이 황당하고 기가 막혔다.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홍여랑을 쳐다봤다. 잔뜩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부끄러워 그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온몸을 떨고 있었다.
"추워요?"
"ㄴ..ㄴ...네."
바닥에 펼쳐 놓은 내 바지 주머니를 뒤져 봤다. 물에 흠뻑 젖은 지갑이 뒷주머니에서 나왔고, 앞 주머니에서 불티나 라이터가 나왔다. 라이터가 발견되자 살 방법이 생긴 듯 반가웠다. 조심스럽게 입김으로 라이터돌 부분을 말려봤다. 라이터돌에서 불꽃이 튀기며 불이 붙을 것 같기도 했다. 라이터돌 부분이 조금 더 마르도록 내버려 두기로 했다.
"여랑씨. 라이터가 있네요. 좀 말려서 불을 지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독님."
"많이 추워요?"
"네."
"어쩌나?"
나는 홍여랑의 옆으로 다가가 앉았다. 홍여랑의 어깨 위에 한 팔을 올리며 안아주었다. 홍여랑이 내게 기대왔다. 바닷물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녀의 머리 결이 내 코 앞에 와 닿았다. 그녀의 피부는 마치 바닷속 해물처럼 미끈거렸다. 추위에 떨어서인지 푸석푸석 느껴지기도 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땔감을 좀 찾아봐야겠는데. 여기 혼자 있을 수 있겠지?”
“어디 가시게요?”
“응. 아까 저 꼭대기에 보니까 숲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구.”
“무서워요. 같이 가요.”
홍여랑이 나를 쫓아 나섰다. 30대 중반, 나름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사진 작가와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낯선 무인도에 단 둘이 알몸을 한채 동굴 밖으로 나섰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떨어지고 있었다.
얼마 걷지 않아 우리는 섬의 꼭대기에 도착했다. 키 작은 야자수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고, 이름 모를 풀과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나는 키 작은 야자수로 다가가 나무 껍데기를 벗겨냈다. 땔감으로 쓰기에 적당해 보였다.
“어머, 감독님. 여기 좀 보세요.”
홍여랑이 소리쳤다. 추위를 달래보려 땔감 구하기에 정신이 없었는데, 홍여랑은 수풀 한 가운데 물이 고여 있는 연못 비슷한 것을 발견해냈다.
“응. 연못인가?”
“그런 것 같아요.”
“우선 땔감을 갖고 다시 아까 그 굴로 내려가요. 우선 밤이 되면 추울 테니까.”
아담과 이브가 살던 에덴 동산의 모습이 이랬을까?
땔감을 동굴 앞에 쌓아 놓았다. 불티나 라이터를 당겨 보았다. 역시 불티나 라이터가 최고였다. 바닷물이 마르고 라이터돌 부분이 건조해지자 다시 활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벗겨낸 야자수 껍데기 한 켠에 한참 대고 있으니 불이 붙었다.
홍여랑과 나는 말없이 나란히 앉아 타오르는 불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떨어졌다. 어둠 속에 보이는 것은 주홍빛으로 타오르는 불빛에 비치는 대한민국 최고 여배우 홍여랑과 나의 발가벗은 몸뿐이었다. 달빛과 별빛에 반짝거리는 바닷물이 배경으로 보였다.
“여랑씨.”
“네, 감독님.”
“걱정돼?”
“그냥 무서워요.”
“우리 배가 실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구조대가 우리를 찾으러 올거야.”
“그러겠죠?”
“그럼. 금방 찾을거야.”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두려움이 가득 찬 표정을 하고 있는 홍여랑의 어깨를 감싸 안아 주었다. 홍여랑이 내 가슴에 얼굴을 기대어 왔다. 묘한 기분이었다. 간혹 촬영 작업을 하다가 유명 모델이나 배우들을 안아 보거나 장기촬영 중 호텔방에서 엔조이를 한 적은 있었지만, 그 유명한 홍여랑을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발가벗은채 안고 있으려니 기분이 묘했다. 성적 충동이 생겼다가도 이 상황에 무슨 짓인가 싶기도 하고.
피곤했는지 홍여랑이 내 가슴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그녀가 잠을 잘 수 있도록 몸에 힘을 주고 있다가 나도 깜빡 잠이 들었나 보다. 그녀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져 눈을 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내 오른손이 그녀의 가슴 위에 올려져 있었다. 홍여랑은 내 허벅지를 베고 누워 있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손이 그녀의 가슴 위에 얹어졌던 것.
“좀 잤어?”
“네. 감독님은요?”
“응. 나도 좀 잤어요.”
힘이 없어진 주홍빛 모닥불에 비춰진 그녀의 알몸이 눈부시게 보였다. 남자는 아무리 배가 고프고 위급한 상황이 와도, 성적 본능은 어쩔 수 없나 보다. 벌거벗고 내 허벅지를 베고 누워 있는 그녀의 모습을 내려다 보노라니 내 물건이 꿈틀꿈틀 움직였다.
그녀의 얼굴 앞으로 허리를 숙여 입술을 탐했다. 그녀가 움찔하더니 입술을 받아 주었다. 태평양의 짠 기운이 그녀의 입술에서 느껴졌지만, 촉감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그녀가 상체를 일으켜 입맞춤의 자세가 수월해지도록 조정을 해주었다. 격렬한 키스를 나눴다.
“감독님.”
“응?”
“감독님만 믿어요.”
“그래.”
뭘 믿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참 키스를 하다가 그녀가 말했다. 왼손으로 그녀의 등을 받쳐 키스를 계속 쏟아 부어주며 오른손으로 그녀의 젖가슴을 매만졌다. 부드럽고 탱탱한 젖가슴이 느껴졌다.
역시 최고 배우는 최고 배우인가 보다. 몸매 어디에도 흠 잡을 곳이 없었다. 손을 내려 그녀의 수풀을 느꼈다. 그녀가 허리를 잠시 움찔하더니 곧 다리를 벌려 내 손의 행위를 수월하게 도왔다. 다리 가운데 그녀의 가장 은밀한 곳에 이르렀다. 태평양 한가운데 바위섬의 저녁 한기 때문인지 그녀의 살갗이 차갑다고 느껴졌건만 그곳만큼은 뜨거워져 있었다.
손가락으로 그녀의 클리토리스를 찾아냈다. 키스를 하며 그녀의 클리토리스를 더듬었다. 그녀가 “아항”하며 예쁜 신음 소리를 냈다.
“감독님.” 그녀가 내 입에서 입을 떼며 말을 했다.
“응?”
“우리 여기서 이대로 죽는 건 아니겠죠?”
“설마. 요즘이 어떤 시댄데. 누군가 구조하러 올 거야. 일단 날이 밝으면 방법을 연구해 보자고.”
모닥불로 훈기가 남아있는 매끈한 바위 위에 몸을 눕혔다. 홍여랑이 내 위에 올라와 내 물건을 입에 물었다. 내 얼굴 앞에는 그녀의 아랫도리가 펼쳐졌다. 20대 초반 여자의 그곳답게 싱싱해 보였다.
그녀는 내 물건을 입에 넣고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내가며 작업을 해주었다. 나도 목을 세워 그녀의 아랫도리 앞에 혀를 가져다 대고 작업을 해주었다. 하나님이 에덴 동상에 아담과 이브를 살게 해주었을 때, 그들도 이렇게 서로를 즐겼을까.
자세를 바꾸어 그녀가 내 위에 기마 자세로 올라탔다. 자신의 구멍을 내 물건에 조준하고 주저 앉았다. 그녀도 이런 황당하면서도 색다른 분위기에서 섹스를 한다는 것이 묘했는지, 잠시 나를 내려다보더니 허리를 돌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서로를 즐겼다. 아니, 그럴 수 밖에 없었다.
어디에서 기운이 났는지. 우리는 동녘이 밝아 올 때까지 섹스를 즐겼다. 몇 차례의 섹스를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나는 다섯 차례 정도 사정을 했고, 그녀는 네 번 정도 내 몸을 으스러지도록 끌어안으며 절정을 느꼈던 것 같다.
2000년도 초반. 전지현이 대한민국 남자들 대부분의 가슴에 자리했던 최고 배우라면, 2000년도 후반에 이르면서 새롭게 떠오른 배우 홍여랑은 이제 22살. 2010년대 대한민국을 대표할 줄 알았던 명배우였다. 이런 배우를, 아무런 조건 없이, 감정의 개입 없이, 밤새도록 즐겼다.
축축한 바위 위에 기대선 내게 그녀가 내 목을 끌어안고 내게 달라붙어 삽입을 하기도 했다. 불록 튀어나온 바위를 양 손으로 잡고 허리를 굽힌 그녀의 뒤에서 삽입을 하기도 했다. 그녀의 보지 안에 사정을 하고서 내 물건을 빼내지 않은 채 그대로 잠시 깜빡 잠이 들기도 했다. 그녀의 보지 안에서 다시 꿈틀꿈틀 힘을 발휘하는 내 물건 때문에 잠에서 깨어 또 다시 격렬한 섹스를 나누기도 했다.
홍여랑과 나는 그렇게 무인도에서의 첫날밤을 보냈다. 서로 지쳐 부둥켜 안은 채 잠이 들었다가 아침 태양이 밝아오는 터에 잠에서 깼다. 태평양 위로 쏟아지는 태양의 작렬함은 광경이었다.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홍여랑을 쳐다봤다. 잔뜩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부끄러워 그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온몸을 떨고 있었다.
"추워요?"
"ㄴ..ㄴ...네."
바닥에 펼쳐 놓은 내 바지 주머니를 뒤져 봤다. 물에 흠뻑 젖은 지갑이 뒷주머니에서 나왔고, 앞 주머니에서 불티나 라이터가 나왔다. 라이터가 발견되자 살 방법이 생긴 듯 반가웠다. 조심스럽게 입김으로 라이터돌 부분을 말려봤다. 라이터돌에서 불꽃이 튀기며 불이 붙을 것 같기도 했다. 라이터돌 부분이 조금 더 마르도록 내버려 두기로 했다.
"여랑씨. 라이터가 있네요. 좀 말려서 불을 지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독님."
"많이 추워요?"
"네."
"어쩌나?"
나는 홍여랑의 옆으로 다가가 앉았다. 홍여랑의 어깨 위에 한 팔을 올리며 안아주었다. 홍여랑이 내게 기대왔다. 바닷물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녀의 머리 결이 내 코 앞에 와 닿았다. 그녀의 피부는 마치 바닷속 해물처럼 미끈거렸다. 추위에 떨어서인지 푸석푸석 느껴지기도 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땔감을 좀 찾아봐야겠는데. 여기 혼자 있을 수 있겠지?”
“어디 가시게요?”
“응. 아까 저 꼭대기에 보니까 숲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구.”
“무서워요. 같이 가요.”
홍여랑이 나를 쫓아 나섰다. 30대 중반, 나름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사진 작가와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낯선 무인도에 단 둘이 알몸을 한채 동굴 밖으로 나섰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떨어지고 있었다.
얼마 걷지 않아 우리는 섬의 꼭대기에 도착했다. 키 작은 야자수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고, 이름 모를 풀과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나는 키 작은 야자수로 다가가 나무 껍데기를 벗겨냈다. 땔감으로 쓰기에 적당해 보였다.
“어머, 감독님. 여기 좀 보세요.”
홍여랑이 소리쳤다. 추위를 달래보려 땔감 구하기에 정신이 없었는데, 홍여랑은 수풀 한 가운데 물이 고여 있는 연못 비슷한 것을 발견해냈다.
“응. 연못인가?”
“그런 것 같아요.”
“우선 땔감을 갖고 다시 아까 그 굴로 내려가요. 우선 밤이 되면 추울 테니까.”
아담과 이브가 살던 에덴 동산의 모습이 이랬을까?
땔감을 동굴 앞에 쌓아 놓았다. 불티나 라이터를 당겨 보았다. 역시 불티나 라이터가 최고였다. 바닷물이 마르고 라이터돌 부분이 건조해지자 다시 활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벗겨낸 야자수 껍데기 한 켠에 한참 대고 있으니 불이 붙었다.
홍여랑과 나는 말없이 나란히 앉아 타오르는 불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떨어졌다. 어둠 속에 보이는 것은 주홍빛으로 타오르는 불빛에 비치는 대한민국 최고 여배우 홍여랑과 나의 발가벗은 몸뿐이었다. 달빛과 별빛에 반짝거리는 바닷물이 배경으로 보였다.
“여랑씨.”
“네, 감독님.”
“걱정돼?”
“그냥 무서워요.”
“우리 배가 실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구조대가 우리를 찾으러 올거야.”
“그러겠죠?”
“그럼. 금방 찾을거야.”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두려움이 가득 찬 표정을 하고 있는 홍여랑의 어깨를 감싸 안아 주었다. 홍여랑이 내 가슴에 얼굴을 기대어 왔다. 묘한 기분이었다. 간혹 촬영 작업을 하다가 유명 모델이나 배우들을 안아 보거나 장기촬영 중 호텔방에서 엔조이를 한 적은 있었지만, 그 유명한 홍여랑을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발가벗은채 안고 있으려니 기분이 묘했다. 성적 충동이 생겼다가도 이 상황에 무슨 짓인가 싶기도 하고.
피곤했는지 홍여랑이 내 가슴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그녀가 잠을 잘 수 있도록 몸에 힘을 주고 있다가 나도 깜빡 잠이 들었나 보다. 그녀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져 눈을 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내 오른손이 그녀의 가슴 위에 올려져 있었다. 홍여랑은 내 허벅지를 베고 누워 있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손이 그녀의 가슴 위에 얹어졌던 것.
“좀 잤어?”
“네. 감독님은요?”
“응. 나도 좀 잤어요.”
힘이 없어진 주홍빛 모닥불에 비춰진 그녀의 알몸이 눈부시게 보였다. 남자는 아무리 배가 고프고 위급한 상황이 와도, 성적 본능은 어쩔 수 없나 보다. 벌거벗고 내 허벅지를 베고 누워 있는 그녀의 모습을 내려다 보노라니 내 물건이 꿈틀꿈틀 움직였다.
그녀의 얼굴 앞으로 허리를 숙여 입술을 탐했다. 그녀가 움찔하더니 입술을 받아 주었다. 태평양의 짠 기운이 그녀의 입술에서 느껴졌지만, 촉감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그녀가 상체를 일으켜 입맞춤의 자세가 수월해지도록 조정을 해주었다. 격렬한 키스를 나눴다.
“감독님.”
“응?”
“감독님만 믿어요.”
“그래.”
뭘 믿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참 키스를 하다가 그녀가 말했다. 왼손으로 그녀의 등을 받쳐 키스를 계속 쏟아 부어주며 오른손으로 그녀의 젖가슴을 매만졌다. 부드럽고 탱탱한 젖가슴이 느껴졌다.
역시 최고 배우는 최고 배우인가 보다. 몸매 어디에도 흠 잡을 곳이 없었다. 손을 내려 그녀의 수풀을 느꼈다. 그녀가 허리를 잠시 움찔하더니 곧 다리를 벌려 내 손의 행위를 수월하게 도왔다. 다리 가운데 그녀의 가장 은밀한 곳에 이르렀다. 태평양 한가운데 바위섬의 저녁 한기 때문인지 그녀의 살갗이 차갑다고 느껴졌건만 그곳만큼은 뜨거워져 있었다.
손가락으로 그녀의 클리토리스를 찾아냈다. 키스를 하며 그녀의 클리토리스를 더듬었다. 그녀가 “아항”하며 예쁜 신음 소리를 냈다.
“감독님.” 그녀가 내 입에서 입을 떼며 말을 했다.
“응?”
“우리 여기서 이대로 죽는 건 아니겠죠?”
“설마. 요즘이 어떤 시댄데. 누군가 구조하러 올 거야. 일단 날이 밝으면 방법을 연구해 보자고.”
모닥불로 훈기가 남아있는 매끈한 바위 위에 몸을 눕혔다. 홍여랑이 내 위에 올라와 내 물건을 입에 물었다. 내 얼굴 앞에는 그녀의 아랫도리가 펼쳐졌다. 20대 초반 여자의 그곳답게 싱싱해 보였다.
그녀는 내 물건을 입에 넣고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내가며 작업을 해주었다. 나도 목을 세워 그녀의 아랫도리 앞에 혀를 가져다 대고 작업을 해주었다. 하나님이 에덴 동상에 아담과 이브를 살게 해주었을 때, 그들도 이렇게 서로를 즐겼을까.
자세를 바꾸어 그녀가 내 위에 기마 자세로 올라탔다. 자신의 구멍을 내 물건에 조준하고 주저 앉았다. 그녀도 이런 황당하면서도 색다른 분위기에서 섹스를 한다는 것이 묘했는지, 잠시 나를 내려다보더니 허리를 돌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서로를 즐겼다. 아니, 그럴 수 밖에 없었다.
어디에서 기운이 났는지. 우리는 동녘이 밝아 올 때까지 섹스를 즐겼다. 몇 차례의 섹스를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나는 다섯 차례 정도 사정을 했고, 그녀는 네 번 정도 내 몸을 으스러지도록 끌어안으며 절정을 느꼈던 것 같다.
2000년도 초반. 전지현이 대한민국 남자들 대부분의 가슴에 자리했던 최고 배우라면, 2000년도 후반에 이르면서 새롭게 떠오른 배우 홍여랑은 이제 22살. 2010년대 대한민국을 대표할 줄 알았던 명배우였다. 이런 배우를, 아무런 조건 없이, 감정의 개입 없이, 밤새도록 즐겼다.
축축한 바위 위에 기대선 내게 그녀가 내 목을 끌어안고 내게 달라붙어 삽입을 하기도 했다. 불록 튀어나온 바위를 양 손으로 잡고 허리를 굽힌 그녀의 뒤에서 삽입을 하기도 했다. 그녀의 보지 안에 사정을 하고서 내 물건을 빼내지 않은 채 그대로 잠시 깜빡 잠이 들기도 했다. 그녀의 보지 안에서 다시 꿈틀꿈틀 힘을 발휘하는 내 물건 때문에 잠에서 깨어 또 다시 격렬한 섹스를 나누기도 했다.
홍여랑과 나는 그렇게 무인도에서의 첫날밤을 보냈다. 서로 지쳐 부둥켜 안은 채 잠이 들었다가 아침 태양이 밝아오는 터에 잠에서 깼다. 태평양 위로 쏟아지는 태양의 작렬함은 광경이었다.

최고관리자
| 가입일 | 2016-08-11 | 접속일 | 2025-01-06 |
|---|---|---|---|
| 가입일 | 2016-08-11 | ||
| 접속일 | 2025-01-06 | ||
| 서명 | 황진이-19금 성인놀이터 | ||
| 태그 | |||
| 황진이-무료한국야동,일본야동,중국야동,성인야설,토렌트,성인야사,애니야동
야동토렌트, 국산야동토렌트, 성인토렌트, 한국야동, 중국야동토렌트, 19금토렌트 |
|||
추천 0 비추천 0